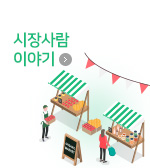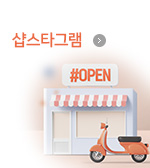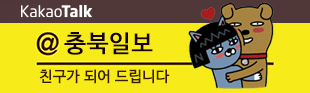냉해를 입은 군자란 한 잎 끝을 보고 화자는 잠시 갈등한다. 보기에 좋지 않으니 밑둥을 잘라버릴까 하다가 흉터도 제 삶이겠지 하고 마음을 바꿔 한 번 더 한 번 더 만져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 심리적 흐름이 참 깨끗하고 자연스럽다. 흉터에 응어리진 군자란과 이를 연민하는 화자의 감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질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만져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독자의 몫이다. 사건의 발단과 연결시키면 봄인 줄 알고 밖에 내놓은 잘못에서부터 말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흉터를 갖기까지 숱한 아픔을 겪어온 군자란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반복될 터이다. 그리고 타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위로와 격려의 말을 시인이 써 놓았다면 그건 시가 아니가 산문이 되었을 것이다. 요즘에 이런 비시(非詩)들이 난무한다. 할 소리 다하며 행 가름만 해놓고 시인 줄 착각하는 시인들이 너무도 많다. 이처럼 독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시를 보고 환호하는 사람도 많다. 시든 무엇이든 아무튼 다변(多辯)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 권희돈 시인
상처를 만지다 / 류정환(1965 - )

밖에 내놓은 군자란이 밤새 냉해冷害를 입어
한 잎 끝이 짓무르더니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마르고 부서졌다.
매끈하던 잎에 상처가 생겨
흉한 것을 며칠 들여보다가
아예 잎 밑동을 잘라버릴까
가위를 들었다 놓기를 거듭하다가
그냥 두기로 하였다.
얼룩진 상처도 제 얼굴이려니
감출 수 없어서 눈길을 붙드는
흉터도 제 삶이려니 싶어
성급함을 자책하는 내 상심傷心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보다 더하랴 싶어
그냥 두고 한 번 더,
한 번 더 만져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