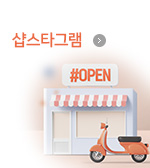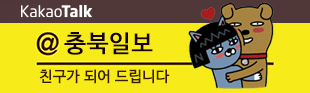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의 회화성을 높였다.
특히 청각의 시각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당시 우리 시단의 주된 경향은 이미지즘이었는데 이미지를 가장 또렷하고 풍요롭게 구현한 시인이 바로 김광균이다.
첫 시집 『와사등』(1939) 출간 후 그는 두 번째 시집 『기항지』(1947)에서 생의 근원과 생명에 대해 깊게 사색하기 시작했다.
도시로 밀려드는 신문명 속에서 지독한 이방인 의식을 느끼고 그 고독감을 혈육(血肉)에 대한 그리움과 죽음 이미지로 표출했다. 죽음이 가져오는 생의 공포와허무는 시 「수의(壽衣)」에 잘 드러나 있다.
시인(화자)은 아내가 손수 지은 두 벌의 수의를 보며 생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새벽까지 괴로워하다가 간신히 잠이 든다.
꿈속에서 새처럼 공중을 날며 정붙이고 살던 남한의 도시와 동네를 둘러보고, 어릴 적 신나게 뛰놀던 판문점 넘어 북녘 땅을 향해 끝없이 날아간다. 이 꿈 속의 장면은 현실의 결여를 역설적으로 대리하는데, 그 정도로 삶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 깊다.
짙은 회한과 상념에 잠긴 채 시인은 삶을 반성하고 죽음을 성찰한다. 죽어서 어디에 묻힐 것이며, 쇠잔해진 육신(肉身)에 수의를 걸치고 머나먼 어둠 속으로 떠나야 하는 자신에게 근원적 슬픔을 느낀다. 그때부터 어두운 지하에서 들려오는 시계소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시인의 영혼을 흔든다.
이 시계소리는 생의 마감을 카운트다운 하는 두려움의 소리이자 매초마다 생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각성의 소리이기도 하다.
「수의(壽衣)」에서 보듯 김관균의 시에는 차가운 지성보다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고독감, 슬픔의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아버지의 죽음과 누이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의 죽음이 가져다준 비극의 연속이 그의 시에 비애의 정서를 낳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애의 이면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라진 생명과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강한 애착 또한 드리워져 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죽음의 비애와 애수의 정서를 세련된 이미지로 그린 휴머니스트이기도 하다.
수의(壽衣) / 김광균(金光均 1914~1993)

생각다 못하여 수의(壽衣) 두 벌을 지었다 한다.
수의란 무엇일까
누가 등 뒤에 와서 나에게 그 옷을 입히는 것인가
역광(逆光)이 기울어진 천정(天井)을 쳐다보며
새벽이 다 되도록 괴로워했다.
그날 밤 꿈에 나는 수의를 입고
공중을 날고 있었다.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할
정다운 서울과 나의 동네를 등 뒤에 두고
판문점(板門店) 넘어
떠나온 지 오랜 아버님 묘소(墓所)와
어렸을 때 놀던 산과 들을 향하여
끝없는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어느 곳에 내가 묻힐 곳은 있는가
언제나 나는 쇠잔한 육신(肉身) 위에 그 옷을 걸치고
아득한 미명(未明)을 향하여 떠나가야 하는가
그날 밤부터
내 생존(生存)의 벽(壁) 위에 수의는 걸려
어두운 지하(地下)에서 들려오는 시계(時計) 소리와 함께
아침부터 밤까지 내 영혼을 흔드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