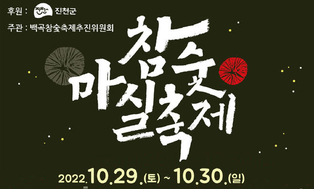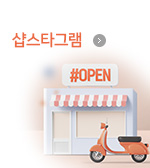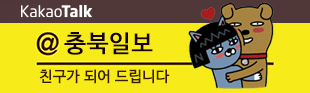첫 번째 미덕은 뒤집기의 기법이다. 인간이 미물이라 생각하는 거미의 눈으로 뒤집어 시적 전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이 익숙하면서 낯설다. 인간의 사용하는 말을 거미가 사용하니까 신선한 느낌을 준다. 칡꽃이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품은 객관적 대상이지만, 거미에겐 무단 침입자이다. 그러기에 무단침입자인 꽃을 치우라고 호통을 치고, 무단 침입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두 번째의 미덕은 생태론적인 관점이다. 인간과 곤충인 거미의 등가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거미와 인간 사이에 어떤 틈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제 거미는 하찮은 미물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우주의 생명 공동체이다. 거미줄은 거미의 집이며 동시에 거미의 세계이다. 그 집의 쥔양반은 거미이다. 거미가 하찮은 곤충이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우주적 공동체이다. 인간과 공존해가야 하는 생명으로 재인식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일상은 우리를 삶의 본질적인 사유형식에서 멀어지게 한다. 무감각의 상태로 접어들게 한다. 무감각에 빠진 우리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장치가 시적 낯설게 하기의 기법이다. 그러므로 위의 시에서 뒤집기의 기법과 생태론적 관점은 시적 낯설게 하기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통해 <치워라, 꽃>은 우리에게 거미란 대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거미와 함께 하는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꽃놀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 권희돈 시인
치워라, 꽃 / 이 안(1967 - )

식전 산책 마치고 돌아오다가
칡잎과 찔레 가지에 친 거미줄을 보았는데요
그게 참 예술입디다
들고 있던 칡꽃 하나
아나 받아라, 향(香)이 죽인다
던져주었더니만
칡잎 뒤에 숨어 있던 쥔 양반
조르륵 내려와 보곤 다짜고짜
이런 시벌헐, 시벌헐
둘레를 단박에 오려내어
툭!
떨어뜨리고는 제 왔던 자리로 식식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식전 댓바람에 꽃놀음이 다 무어야·
일생일대 가장 큰 모욕을 당한자의 표정으로
저의 얼굴을 동그랗게 오려내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퉤에!
끈적한 침을 뱉어놓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