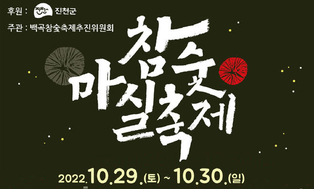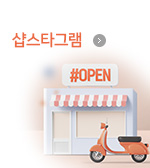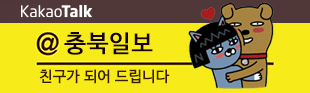소재적인 것의 뼈대가 일체 드러나지 않고 언어가 그 자체로 소리를 내는 울림의 시이다. 이 시의 언어는 어느 한 때의 객관 사회를 속울음의 깊이에서 중재한다. 떨리는 객관세계와 술 때문에 떨리는 손 사이에 시적 화자의 단호한 발언이 개입한다.
덧칠하지 않은 과거의 어느 순간이 사람다웠다고 회상하는 주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성을 지니고 있으나 사회성은 언어표현 속에 용해되고 주제적 내용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좋다, -떨린다, -울었다 등과 같이 화자의 감정은 출렁거리고 있지만, 시적 화자를 불안하게 했던 객관적 사회는 드러나지 않는다. 손이 떨리도록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체 자신의 불안을 표현함으로써 주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사회의 이미지가 더욱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언젠가 호사가가 나타나 증언하리라. 그 떨림으로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이 사나운 시대를 의 눈으로 바라본 대표적인 정신이었다고. 그 때 이 시도 함께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 권희돈 시인
검은 소묘 / 정희성(1945 - )

아득한 옛 추억 같은
흑백영화 같은 여운의 그림이 그냥 나는 좋다
술 때문에
손이 떨린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울었던가
그 손떨림이 마침내
그림이 되었구나
대명천지 허허백지 앞에 맨 정신으로
떨리지 않고
어찌 사람이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