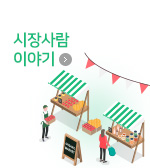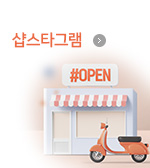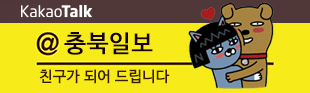9월 들어 햇볕이 해쓱하게 여위었다. 여윈 햇볕의 크기도 운동장 만하다가 동네 마당 만하다가 연잎 만하게 작아졌다. 시인은 햇볕의 온도가 낮아지고 햇볕의 색깔이 하얘지고 햇볕의 크기가 작아지는 3중의 의미를 잔류부대로 처리하여, 가을 초입의 이미지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그려놓았다. 찢어져 너풀거리는 호박잎을 버려진 군용텐트나 여자들로 비유한 장면은 압권이다. 풀잎들과, 꽃들과, 나무들은 잔혹한 폭염과의 전쟁 중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터. 폭염은 야반도주하는 사람처럼 물러갔지만, 처절했던 전장, 전투 뒤의 파괴 현장같이 조락해가는 초록의 쓸쓸함이 아릿한 여운으로 남는다. 자연은 이렇듯 신열로 몸살을 앓으며 계절을 변화시키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쩌면 거울 속 같이 조용한 세상인지 모른다. 전장을 피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소리 없이 돌아오듯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고, 여름이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이 와서 일상의 창문이 열리고 닫힌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때는 아름답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아침, 빨래가 마르는 때, 어부가 그물질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 빈 집으로 돌아오는 때. 9월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때이다.
/권희돈 시인
9월 / 문인수 (1945- )

무슨 일인가, 대낮 한 차례
폭염의 잔류부대가 마당에 집결하고 있다.
며칠째, 어디론가 계속 철수하고 있다.
그것이 차츰 소규모다.
버려진 군용 텐트나 여자들같이
호박넝쿨의 저 찢어져 망한 이파리들
먼지 뒤집어쓴 채 너풀거리다
밤에 떠나는 기러기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몇몇 집들이 더 돌아와서
또, 한 세상 창문이 여닫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