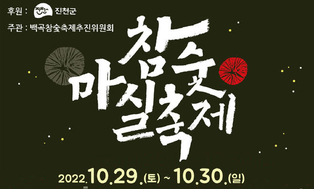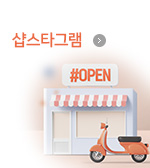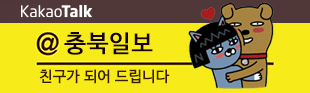노향림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주요 특징은 대략 3가지다. 첫째는 시인 자신이 이미지 속에 철저히 가려진다는 점이다. 시인은 풍경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은 채 풍경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통해 마음을 드러낸다. 둘째는 사물들이 시의 주체로 등극하면서 정작 시인은 지독한 고독 속에 놓인다는 점이다. 시속의 이미지는 시인의 고독과 자의식이 반영된 심리적 치환물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는 비인간적이라 할 만큼 냉정한 시선으로 이미지를 병치시키거나 병렬시킨다는 점이다. 이미지가 의미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미를 배제하면서 건조하게 풍경을 그리는데 이런 객관적 묘사를 통해 삶에 드리워진 불안과 고독, 허무와 절망, 고통과 꿈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압해도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다도해 중 하나로 목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섬이다. 개펄이 많아서 갯것이 많은 곳으로 시인의 유년 시절 그리움이 농도 짙게 배어있는 공간이다. 시인의 꿈과 동경, 아픔과 슬픔이 함께 자리하는 신화적 원형공간이다. 어린 시절 시인이 목포시 산정동에 살 때 마을 야산 기슭에서 바라보던 건너편 압해도, 섬 주변의 개펄과 파도와 바람은 시인의 기억들이 아로새겨진 이미지 파편물들이다. 개펄, 바람, 바닷물 등이 낭만적 서정으로만 채색되지 않고 비애와 질곡의 시간을 품은 비극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람에 살이 하얗게 깎인 파도나, 등이 굽고 관절이 깎인 채 개펄을 기는 바람은 자연의 풍경이면서도 개펄을 제 살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바닷가 아낙들의 모습으로 읽힌다. 풍경이 곧 사람인 비극의 이미지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노향림 시 전반에 나타나는 풍경엔 풍경과 함께 살을 섞고 살아가는 자들의 비애와 아픔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슬픔에 젖은 눈으로 인간의 아픈 생애와 낮은 곳을 바라보는 시인의 비극적 시선이 느껴지는 시다.
/ 함기석 시인
바람은 치마를 끌며 - 노향림(盧香林 1942∼ )
살이 하얗게 깎인 파도가 많다.
파도가 파도끼리
앞의 파도가 뒤의 파도에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한다.
갯벌에는 밤새 빠져 나갈
구멍이 있을까·
바다엔 구멍이 많을 테지·
뻘밭을 훑으며
바람은 치마를 끌며 스스로 얼게미를 만든다.
마을 속에 떨어진
마을을 건지려고
얼게미를 만든다.
뻘밭 전체를 껴안으며
바닷물이 이야기한다.
제 몸이 굽어
뻘밭이 되는 줄도 모르고
바다 전체를 껴안으며,
압해도엔 바람이 분다.
등이나 관절 부위가 하얗게 깎인
바람이 긴다.
압해도가 나를 가두어 놓고
바람이 분다.
남은 생애를 몇 소쿠리
건지기 위해
전 생애로 부는 바람
오늘도 부는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