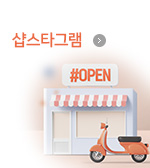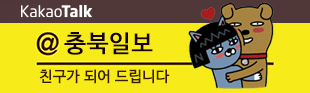한 줄의 시나 한 권의 소설도 읽지 않았으나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 훌륭한 비석을 남긴 사람은 분명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사람이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하여 얼마나 남을 속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얼마나 남을 짓눌렀으며, 자신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는 일체 말이 없다. 이처럼 모른척하고 말하는 화자의 진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이 그것도 유명한 시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써 바치는 세태 즉 시인조차 속물화되어가는 세태를 날카롭게 풍자한다. 묘비는 불의 뜨거움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터인데, 도대체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며 질문을 던진다.
시인이 많아진 탓일까? 자본주의가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의식까지 물질화 해 버린 탓일까· 문인을 기리는 문학비가,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문인을 기리는 문학비가 푸석한 돌멩이처럼 발에 채인다.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가 쉽게 씌여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였는데, 이제 시인들은 시 쓰는 기교를 배울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미 자기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으니, 사후에는 누가 자신들을 기려비석을 세워줄 것이며, 그 비석에 새겨 넣어야 할 비명(碑銘)은 무덤에서나 찾을까?
/ 권희돈 시인
묘비명(墓碑銘) / 김광균(1941 -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