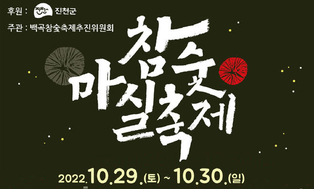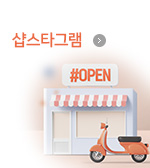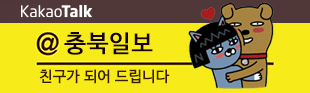1953년 7월 27일 6.25동족상잔의 총성이 멈추자, 유엔군과 북한군은 38선에서 각각 2킬로미터씩 떨어진 곳에 휴전선(군사분계선)을 긋기로 약속한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공간 휴전선은 이렇게 남의 손으로 그어졌다. 그 후로 휴전선은 화산 같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공간으로, 나무 한 그루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쌀쌀한 공간으로, 고구려의 웅혼한 기상도 신라의 삼국통일 이야기도 사라진 공간으로,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형제의 가슴에 총을 겨누며 제어하기 힘든 격발의 긴장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엄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숨 막히는 공간에 꽃으로 서 있는 한 젊은이는 묻는다. 언제까지 왜 서로 불신의 얼굴로 총을 겨누어야 하는가. 이렇게 냉랭한 자세로 서로 경계하고 서 있는 젊음이 진정한 젊음인가.
이 물음이 수미쌍괄법으로 두 번 강조되는데, 여기에 시인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남북 간에 이런 대립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전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 양쪽 모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자세로 변화하라.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말하기 전에 분단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성숙한 우리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박봉우의 <휴전선>을 읽으면서 혹은 가르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분단의 대립과 증오심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다. 이제 분단을 막연히 안타까워하고 개탄하거나 서로를 물어뜯는 비루한 행동을 일삼거나 통일이여 어서 오라고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청산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완의 역사에서 완료형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결핍된 문제를 깊이 관조하고 청신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시인이 스무 살 갓 넘은 나이에 쓴 작품이다. 그 때의 젊은이는 분단을 아파하고 휴전선에서 서로 총을 겨누는 싸늘한 응시를 저토록 아파했는데, 오늘의 스무 살 젊은이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 권희돈 시인
휴전선 / 박봉우(1934 - 1990)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