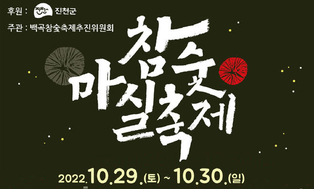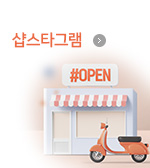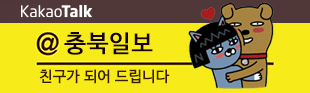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새끼거미가 어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는 어미를 찾으며 아물거린다. 가슴이 미어질듯 한 시인은 거미 가족이 한 곳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은 새끼를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어미와 형제가 있을 문밖에 내어놓는다. 시인의 슬픔과 고뇌가 애잔하게 느껴지는데, 이 시 속의 거미 가족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이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우리민족 수난의 역사를 반영한다.
백석은 작고 약하고 여린 것들에 깊은 연민을 느낀 시인이다. 북방 정서가 짙은 농촌 토속어를 사용하여 상실되어가는 모국어와 민족정신을 지키려했다. 그가 활발하게 시작(詩作) 하던 1930년대 중후반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의 전쟁동원에 협조하며 선동성 시국강연을 하던 시절이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민족정신의 붕괴, 말의 타락이 심화되던 절망의 공간이었다. 지옥 같은 혼돈과 번뇌의 아수라(阿修羅) 세계였다. 이런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백석은 민족의 주체적 자아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으로 농촌을 택했다. 일제의 극악한 민족성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촌은 혈연과 거주지로 끈끈하게 엮인 생활공동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뼈아픈 반성과 각성이 있었기에 그의 대표작 「수라」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80여년 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 함기석 시인
수라(修羅) / 백석(白石 1912~1995)

차디찬 밤이다
언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히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밖으로 버리며
이것이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