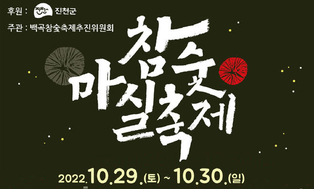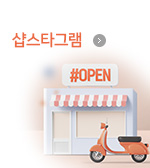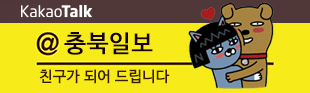그는 또한 시의 새로움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난해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거꾸로 쓰기도 시도했고, 시를 끝 행부터 거꾸로 씀으로써 의식의 단절과 행간의 의미 비약에 따른 낯선 효과를 노리기도 했다. 즉 시대적 혼란기 속에서 그는 기성질서에 대한 반역과 도전을 꾀하며 자유를 향한 열망을 술과 사랑과 시로 풀어냈던 것이다. 때문에 지금도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후의 황폐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청록파적 시 경향에 반발하여 전통 서정을 부정하고 새로운 모더니즘을 모색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한자어의 범람, 어휘의 빈곤, 경박한 멋 부리기, 산만한 이미지 등을 지적하는 부정적 평가도 공존한다.
6.25 이후의 한국문학은 전쟁의 비극적 체험, 삶에 대한 혼돈과 회의, 도시 문명화에 따른 비인간화 현상 등 허무적 경향이 짙다. 이 시기 동안 쓴 박인환의 시에도 허무의식과 센티멘털 감정이 짙게 드러난다. 전쟁의 참화와 비극, 폐허가 된 땅과 암담한 현실, 도시적 우수가 깃든 페이소스 등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전후의 정신적 황폐와 불안감이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동안 그에게 시는 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한 줄기 눈물도 없이'는 박인환이 1951년 육군 소속 종군작가단으로 참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쓴 시다. 자유를 위해 전쟁을 치르다 죽은 어느 젊은 병사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박격포 포탄이 터지고 수류탄이 터지는 전장에서 무참하게 죽은 병사의 주검 위로 음산한 잡초만 무성하고 비가 내린다. 생명에 대한 허무감, 시대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짙게 느껴진다. 이제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 주검이 널브러진 들판은 종전(終戰) 후 살아남은 자들의 내면이자 사회현실, 시인의 눈에 비친 조국의 현실이자 시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 줄기 눈물도 없이-박인환(朴寅煥 1926~1956)
용사가 누워 있었다
구름 속에 장미가 피고
비둘기는 야전병원 지붕 위에서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기다리는
용사가 대열을 지어
전선으로 나가는 뜨거운 구두 소리를 듣는다
아 창문을 닫으시오
고지탈환전
제트기 박격포 수류탄
어머니! 마지막 그가 부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옛날은 화려한 그림책
한 장 한 장마다 그리운 이야기
만세소리도 없이 떠나
흰 붕대에 감겨
그는 남모르는 토지에서 죽는다
한 줄기 눈물도 없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는 피와 청춘을
자유를 바쳤다
음산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엔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