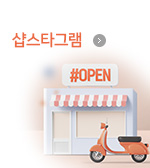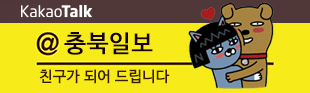시인의 고통의식은 가난, 외로움, 새 등의 어휘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자 시인 자신의 실존을 대리하고 새는 삶과 죽음의 접경지대를 향해 날아간다. 왜 그럴까· 시적 자아가 겪는 지상의 삶이 그만큼 견디기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이다. 새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소재로 자유가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시인의 갈망이 담겨 있다. 고통으로 점철된 지상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에 닿고자 하는 욕망의 대리물로 시인 자신의 초상인 셈이다.
'불혹의 추석'은 천상병의 후기 작품이다. 마흔의 나이에 홀로 추석을 맞이한 시인의 고독감과 고통의식이 드러나 있다. 무지한 자가 말이 많다는 노자(老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시인은 빈촌(貧村)의 대폿집에서 어버이의 제사를 지낸다. 찌그러진 상 위에 막걸리 한 사발 따라놓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깊은 상념에 잠긴다. 지나온 인생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말보다 침묵의 자세로 나머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이처럼 천상병의 후기 시에는 일상을 소재로 삼아 인생에 대한 철학적 사유, 실존적 자아성찰이 펼쳐진다. 자연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관조한다. 자아의 투영을 가능한 억제해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살려내려 한다. 즉 일상의 소박한 것들 속에서 시인은 삶의 비의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침묵으로 사색한다. 이에 따라 시의 형식 또한 하강구조를 취한다.
천상병의 시 전반에 나타나는 공간은 크게 상승구조와 하강구조로 양분된다. 상승구조는 시인의 갈망 또는 의식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날아오를 때 나타나고, 하강구조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할 때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시인의 의식이 상승보다 하강할 때가 훨씬 많고 이런 하강구조는 형식 자체로 시인이 인생에서 겪은 비애와 질곡, 번뇌와 절망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불혹(不惑)의 추석(秋夕) / 천상병(千祥炳 1930~1993)

아는 사람은 떠들지 않고
떠드는 자는 무식이라고
노자(老子)께서 말했다.
그런 말씀의 뜻도 모르고
나는 너무 덤볐고,
시끄러웠다.
혼자의 추석이
오늘만이 아니건마는
더 쓸쓸한 사유는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이다.
막걸리 한 잔,
빈촌 막바지 대포집
찌그러진 상 위에 놓고,
어버이의 제사를 지낸다.
다 지내고
음복을 하고
나이 사십에,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찾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