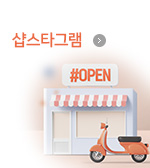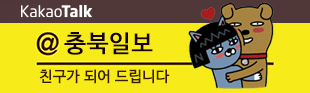박남수의 시는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초기 시에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식민지 현실이 조명된다. 식민화된 땅에서 겪는 시인의 고통과 불안감이 상징적 시어들로 함축되어 나타난다. 주관적 감정이나 해석을 최소화하여 간결하고 정제된 문장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비약적 암시성을 띠고 시의 밀도는 높아진다.
중기 시에는 6.25 전쟁의 참화가 낳은 비극적 상황과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암울한 절망 속에서 시인은 인간 존재에 대해 고뇌하고 회의하는 실존주의적 태도를 취하는데, 불안에 휩싸인 자아의 심리적 위기의식, 삶에 대한 허무의식이 짙게 나타난다. 박남수 시의 중요 소재인 새는 당시 전쟁의 참화 속에 놓여있던 시인 자신의 초상, 죽음과 허무의식이 드리워진 표상이다. 시인이 추구했던 순수의 본질적 요체로 그의 시의 핵심 소재라 할 수 있다. 이 새를 운동성을 통해 상승 후의 하강에 의해 새의 존재는 완성되고, 빛은 어둠 때문에 의미를 띠고, 삶은 죽음에 의해 완성된다는 자각에 다다른다.
후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인 자신의 생활이나 신변과 연관된 시들이 많아진다. 초중기의 수사적인 표현, 절제된 언어는 다소 줄어들고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독과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죽음과 상실 속에서 보내는 시인의 유폐된 자아가 절실하고 안타깝게 드러나는데 특징적인 점은 삶과 죽음의 합일, 생성과 소멸의 동일화, 지상과 천상의 통합적 수용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새 이미지 또한 계속 등장하지만 후기에 접어들면서 상승 이미지보다 하강 또는 추락의 이미지가 우세해진다. 또한 고국을 떠나 먼 이국땅에서 살아온 유랑민으로서의 고독과 아픔도 시의 곳곳에 나타난다.
시 「훈련」은 후기의 시집 『그리고 그 이후』(1993)에 수록된 작품이다. 유랑의 삶을 함께 했던 아내의 죽음을 겪고 쓴 것으로 생전의 아내의 애절한 마음이 잘 묻어나 있다. 자신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질 남편을 근심하는 아내의 애틋한 속마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시다. 이 시에서처럼 시인의 후기 시들 전반에 걸쳐 죽음에 대한 초월적 수용과 화해의 태도가 나타난다. 시인에게 인생은 아내와 함께 걸어온 아름다운 소로(小路)였고 그것이 곧 새의 길, 자궁에서 무덤에 이르는 고독의 길이자 쓸쓸한 유폐의 길이었던 것이다.
/ 함기석 시인
훈련 - 박남수(朴南秀, 1918∼1994)
입을 수가 없다. 불편하다.
내 손으로 끈을 갈 재간이 없다.
제 딸더러도 끈을
갈아 달라기가 거북하다.
불편하다. 이제까지
불편을 도맡았던 아내가
죽었다. 아내는
요 몇 해 동안, 나더러
설거지도 하라 하고, 집앞
길을 쓸라고도 하였다.
말하자면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성가시게 그러는 줄만
여기고 있었다. 빨래를 하고는
나더러 짜 달라고 하였다.
꽃에 물을 주고, 나중에는
반찬도 만들어 보고
국도 끓여 보라고 했다.
그러나 반찬도 국도
만들어 보지는 못하였다.
아내는 벌써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팬티
끈이 늘어나 불편할 것도
불편하면서도 끙끙대고 있을
남편의 고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