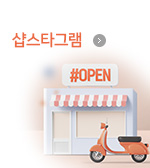전체기사
-

65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북한산 둘레길'
지난 23일 '65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이 북한산 둘레길에서 열렸다.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 조성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로 현재 21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소나무 숲길과 순례길로 구성된 1·2 구간.청원 출신의 독립운동가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역을 시작으로 트레킹이 시작됐다. 수려한 경치는 없었지만 숲길과 동네길을 오가는 완만한 가을 산책 코스에 회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점심시간에 펼쳐진 휴식시간에는 여러 회원들의 김장 솜씨자랑이 펼쳐졌다.김웅식 대장은 "숲 속에 데크를 설치하거나 계곡의 돌을 중간 중간에 박아 두는 것은 땅이 숨 쉬게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과 함께 "회원들이 너무 잘 따라와 줘서 코스를 좀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2구간까지 비교적 수월했던 산행 때문인지 회원들의 발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3구간 흰구름길로 향했다.냉골 지킴터와 화계사를 지나 가파른 언덕을 서너번 올랐을 무렵 비로소 등산객답게 빨개진 얼굴로 땀을 흘리며 웃었다. 독특한 모양의 원형계단으로 이뤄진 구름전망대에서는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아차산 등의 주위 경관이 한 눈에 들어왔다.4구간 솔샘길의 출입구에 들어서
- 김희란 (2013.11.24 14:28:04)
- 0
- 8
-

초수리 행궁, 화염에 휩싸이다
세종대왕은 초정약수를 발견한 '어떤 사람'에게 목면(무명) 10필을 하사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뢰기를, "청주에 물 맛이 호초맛과 같은 것이 있어 이름하기를 초수라 하는데(…) 이 물을 얻어 가지고 와서 아뢴 자에게 목면 10필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초정약수를 발견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초정약수의 발견과 관련된 전설이 이육(李陸·1438-1498)이 지은 청파극담(靑坡劇談)에 실려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어떤 늙은 농사꾼이 언덕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귓가에 은은히 군마의 소리가 들리기에 일어나 보니 평지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달려가 사또에게 고했으며 이리하여 소문이 널리 퍼진 것이었다.' 그는 앞 문장을 '서원에 초수라는 물이 있다. 내가 안찰사가 되어 이를 살펴보니, 물이 땅 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데 아주 차고 맛이 쓰다. 뱀이나 개구리가 뛰어들기만 하면 곧 죽는다'라고 적었다. 1444년 봄. 내섬시윤 김흔지에 의해 초정약수 행궁이 세워졌으나 당시 모습을 확인해 주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온양 행궁과 관련 그림이 현존하고 있어 조선시대 온천행궁의 규모·배치를…
- 조혁연 (2013.11.21 17:38:06)
- 0
- 4
-

극심한 가뭄…경호군을 돌려 보내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반차도'(斑次圖)에는 적어도 수천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중 상당수는 호위 군사들이지만, 남녀노소의 일반 백성 모습도 많이 그려져 있다. '국왕의 행차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나온 백성들이다. 1444년 봄. 세종대왕이 한양도성을 나서 우리고장 초정약수로 향할 때도 같은 모습이었다. 심지어 격쟁하는 노인도 있었다. 격쟁은 임금이 행차할 때 징을 치며 그 앞으로 나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을 말한다. '연세가 85세쯤 되는 늙은이가 임금이 탄 수레 앞에서 원통함을 아뢰니, 병조에 내려 이유를 가리게 하고, 인하여 술과 음식을 먹이고 면포 1필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세종이 그해 봄 1차 초수리 거둥을 마치고 한양도성으로 되돌아갈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충청감사 이선(李宣)이 "종량(種糧)이 부족한 인민들이 거가 앞에서 하소연할까 염려되니 현재에 있는 잡곡으로 고루 주게 하고 그 떠들썩하게 하소연하는 자를 금하게 하라"(5월 5일자)고 명령했다. 그 때문이었다. 이에 세종은 이선의 행동을 핵실(조사)하도록 사헌부에 명령했다. 세종은 초정약수에 머물 때도 위민(爲民)의 모습을 자주 보였다.
- 조혁연 (2013.11.19 16:19:17)
- 0
- 4
-

"괴산 청안은 한국 조세사의 못자리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 의견을 획득, 명분을 확보한 세종대왕은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는 등 토지세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세종은 진양대군을 도제조, 하연, 박종우, 정인지 등을 제조로 임명했다. 이중 정인지가 공법 실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법을 시행하려면 새로운 양전(토지조사)과 등급을 매겨야 했으므로 많은 실험이 필요했다. 그 실험지가 된 것이 바로 초정약수 고개 너머의 청안현이었다. "지난번에 초수에서 김종서와 이숙치 및 정인지로 하여금 함께 청안의 밭을 심사하여, 깊이 밭의 등수를 나누는 예를 안 연후에, 다섯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등수를 정하니, 밭의 품등이 거의 바르게 되었다."- 1444년. 세종대왕이 그해 가을에 초정을 다시 찾기 위해 한양도성을 나선 것은 윤7월 15일이었으나 언제 초수리에 도착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 다만 1차 거둥의 예로 봤을 때 한양서 초수리까지는 매번 닷새가 소요됐다. 따라서 세종은 윤7월 20일에 초수리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의 작성 시점은 '1444년 7월 13일'이다. 그렇다면 인용문의 '지난번에 초수'는 1444년 봄으로, 이때 이미 청안현이 공법의 실험지로
- 조혁연 (2013.11.14 16:16:08)
- 1
- 4
-

청안현을 대상으로 貢法을 실험하다
세종대왕은 공법(貢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지 10년만에 결단을 내렸다. 세종은 관료는 물론 '여염의 세민(細民)', 즉 평민에까지 공법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명하여 "정부·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細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론조사는 이런 배경하에 실시됐다. 조선 전기는 당연히 모든 권력이 국왕 1인에게 집중돼 있고 또 신분의 차별이 뚜렷한 봉건시대였다. 그럼에도 세종이 '세민'의 여론까지 들어보려 한 것은 이미 그때 민주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인 만큼 여론수렴 결과는 다섯 달 후인 그해 8월 초순에 나왔다. 결과는 공법시행 찬성 의견이 대략 57%, 반대가 42%로 찬성자가 많았다. '호조에서 중외의 공법에 대한 가부(可否)의 의논을 갖추어 아뢰기를, (…) 무릇 가하다는 자는 9만 8천 657인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만 4천 149명입니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당시 여론조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수는 총 1
- 조혁연 (2013.11.12 16:24:33)
- 0
- 5
-

봄엔 한글, 가을엔 공법을 고민하다
전통시대 동양의 조세개념은 조용조(租庸調)였다. 중국의 수나라 때부터 등장한 제도로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여 곡물, 용(庸)은 사람에게 부과하여 노동력, 조(調)는 호(戶)에 부과하여 특산품을 각각 징수·징발했다. 조선도 이같은 원칙을 준용, 농지를 가진 농민들에게는 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듯이 조선의 토지제도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공법(貢法)-영정법(永定法)-비총법(比總法) 순으로 변했다. 답험손실법은 글자 그대로 '담헙'과 '손실'이 합쳐진 표현이다.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의 조정은 농사의 작황을 현지에 나가 집적 조사하는 것을 '답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손실법은 작황에 따라 등급을 메기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령 어느 지역의 농토는 가뭄 때문에 작황에 안 좋아 C정도의 수확을 했다. 그러나 현지에 조사를 나간 관리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 A라고 판정하는 경우가 부지기였다. 세종은 즉위한지 얼마 안 된 때부터 토지세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토질의 전분6등법, 풍흉의 연분9등법으로 잘 알려진 '공법'(貢法)이다. 세종 즉위 3년(142
- 조혁연 (2013.11.07 16:04:30)
- 0
- 4
-

'초수리에서 훈민정음에 급급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세종대왕이 청주목 초수리(초정약 지칭)에까지 와서 훈민정음 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미리 말하면 그런 의구심은 시간 낭비가 된다. 세종대왕은 1444년 초정약수에까지 와서도 훈민정음 문제를 매우 골똘하게 생각했다. 그 증거는 아이러리컬하게도 훈민정음 창제의 열렬한 반대자였던, 당시 집현전 부제학(정3품) 최만리(崔萬理·?-1445)의 상소문 안에 들어 있다. 최만리의 상소문은 양이 매우 많아 단독이 아닌, 집현전 학자들의 집단상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최만리는 자신이름의 상소문에서 △훈민정음 창제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말(훈민정음 지칭)만 알면 한자로 써있는 공문서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등 세세한 내용까지 상소했다. 그리고 그런 최만리는 이 상소문에는 "어찌 이것만은 행재에서 급급(汲汲)하게 하시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언문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마쳐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聖躬)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인용문 중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작업, '행재'는 초정약수 행궁, '성
- 조혁연 (2013.11.05 16:38:29)
- 0
- 7
-

당시 초수리 민가수는 38호였다
세종대왕 대의 과학발전에 기여한 인물로는 장영실과 이천이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사료를 보면 김조(金金+兆·?∼1455)라는 인물도 적지 않은 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물시계인 자격루 발명에 큰 공을 세웠다. 이긍익이 지은 연려실기술에는 김조와 관련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기기는 비면 기울고 물이 중간쯤 차면 바르고 가득 차면 엎어짐이 모두 옛 말씀과 같아서 이로써 천도(天道) 영허(盈虛)의 이치를 살피게 되었다.'- 세종대왕이 우리고장 초수리(초장약수)에 거둥할 때 당시 충청도관찰사가 바로 김조이다. 그의 보고를 통해 당시 충청도 가뭄과 그에 따른 기근현상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혹은 기근으로 나물만 먹는 자도 있고, 혹은 먹지 못해서 부황이 난 자도 있으며, 쌓아 둔 곡식도 많아야 1, 2두(斗)에 불과하고, 적은 자는 1, 2되 밖에 없는데, 혹 떨어진 자 중에는 경작하던 토지에 파종도 하지 못한 자가 3분의 1분은 된다 하니….'- 식량이 남아 있다는 사람도 기껏해야 1~2말, 적은 사람은 1~2되라고 세종께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이 초수리에 거둥하던 때의 가뭄은 전년도부터 계속 된 것이라는데 더 심각성이 있었다. 이에 세종
- 조혁연 (2013.10.31 17:42:12)
- 0
- 4
-

그해 심한 가뭄의 주범은 '높새바람'
가뭄과 기근은 혼용되는 면이 있으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가뭄은 기상적인 현상이고, 기근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굶주리는 현상을 말한다. 세종대왕이 우리고장 초정약수를 찾은 1444년 가뭄으로 인해 충청도 일대에 대규모 기근(飢饉)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실록은 그 실상을 '사람들이 나물만 먹은 빛을 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병조 판서 정연이 아뢰기를, "신이 청안(淸安) 지방에 가니, 남녀 30여 인이 모두 나물을 캐고 있으므로, 신이 종자(從者)를 시켜서 살펴보니 모두 나물만 먹은 빛이 있었습니다."'- 기근현상이 좀더 심한 지역에서는 아사자도 속출, 장례를 치르지 못해 시신을 길가에 방치하기도 했다. 당시 예조는 세종에게 이런 보고를 한다. "이제 파종한 것이 싹이 섰고 밀·보리가 팰 때를 당하였는데, 여러 날 비가 오지 않으니 (…) 원통한 옥사를 살펴보고 빈곤한 자를 진휼하며, 시체와 해골들을 묻어 주게 하소서" 하니…'- 세종은 자신이 초수리에 머물고 있는 기간에 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에 대해 이른바 "내탓이오" 의식을 보였다. 또 배곪는 충청도 백성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이른바 '보고 라인'을 先시행- 後보고 형태로 바꾸기도 했다
- 조혁연 (2013.10.29 16:08:25)
- 0
- 4
-

64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통영 사량도'
지난 26일 64회를 맞은 '충북일보 클린마운틴'의 산행길은 경남 통영 '사량도'였다.바다 건너 기암괴석에 올라 한려수도를 바라보기까지는 여간 배짱이 두둑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엄두도 못 낼 정도였다.출발은 마냥 신났다.청주에서 차로 세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남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 내 유람선 선착장.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하늘 끝자락에 보이는 작은 섬을 향해 다시 배 위에 올랐다.남는 건 사진이라고 했던가. 회원들은 저마다 잔잔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껏 폼을 잡으며 사진 찍기에 바빴다.20여 분의 짧은 항해 끝에 도착한 사량도 내지마을은 등산코스로 유명한 상도에 있다.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 길을 따라 본격적인 4.1km 산행이 시작됐다.도심 속 산과 달리 여기저기에 넝쿨들이 눈에 띄었다.김웅식 대장은 "넝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토끼, 꿩 등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내지마을에서 연무사거리까지 1.3km는 비교적 무난한 등산길이었다.능선을 따라 약 1km를 걸어가면 불모산 달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부터가 죽음의 코스다.가파른 기암괴석을 오르기란 앞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기 때문이다.그러나 아기자
- 최범규 (2013.10.27 18:15:59)
- 0
- 11
-

왜 초수리 玉의 발견에 열광했을까
1444년, 세종대왕의 거둥에 발맞춰 초수리 뒷산에서 옥(玉)이 발견되자 나라 전체가 경사스런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시 영의정 황희는 이를 "태평성대의 징표"라는 식으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정은 옥 발견지 일대를 특별 경비하도록 했다. "초수리(椒水里)에서 산출되는 옥(玉)은 실로 세상에 드물게 보는 보배이니 사사로 채굴하지 못하게 하고 그 낭비와 금지를 엄하게 해야 하겠다"- 이어지는 문장은 "금지와 방비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간사한 무리들이 반드시 틈을 타서 몰래 채굴할 것이니, 마땅히 그 주위를 가시나무들로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고, 문에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 친히 글짜를 써서 봉해 놓고는…"(〃)라고 쓰여 있다. 지금 사람들은 옥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일부 애호가들이 악세서리용으로 사용하나 그 값은 금·은에 훨씬 못미친다. 그럼에도 당시 세종대왕과 대신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의외로 음악과 관련이 있다. 세종대왕은 중국 것이 아닌, 조선 고유의 악기로 종묘의례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음을 지닌 악기를 가질 수 없었다. 이때 경기도 남양에서 옥의 일종인 경석(磬石)이 발견됐다. 경석은 가공이 쉽기 때
- 조혁연 (2013.10.24 16:46:05)
- 0
- 4
-

"초수리 옥은 세상의 보배이다"
완벽(完璧)은 보통명사처럼 보이나 실은 중국 고사성어에서 유래했다. 중국 조나라 혜문왕은 '화씨의 벽'(和氏之璧)이라는 희귀한 구슬을 갖고 있었다. 원래 한 신하의 애장품이었으나 강제로 빼앗았다. 강대국 진나라의 소양왕이 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생겼다. 그는 조나라에 사신을 보내 15성(城)과 구슬을 맞바꾸자고 청했다. 혜문왕은 소양왕의 속내가 뻔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했다. 이때 명신이자 책략가인 인상여(藺相如)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진나라로 가 화씨지벽을 일단 소양왕에게 바쳤다. 이에 구슬을 받아 쥔 소양왕은 "과연 훌륭하구나"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으나 성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이를 예상하고 있었던 인상여가 "그 구슬에 한 군데 조그만 흠집이 있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소양왕이 이를 무심코 내주었다. 그러자 인상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신의를 지키느라 구슬을 지참했으나 왕은 15성의 약속을 지킬 듯 싶지 않으니 이 구슬은 일단 소생이 지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생의 머리와 더불어 이 구슬을 부숴 버리겠습니다."- 인상여의 심리전은 먹혀들었고 구슬은 무사히 조나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등장하는
- 조혁연 (2013.10.22 17:42:49)
- 0
- 4
-

초수리 왕자, 첫사랑을 못잊어 하다
1444년. 세종대왕이 우리고장 초정약수까지 데리고 온 막내아들 이염(李琰·영흥대군) 왕자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영흥대군(후에 영응대군)은 초수리 약수에 왔던 그해에 여산송씨 가문의 규수와 혼인했지만 5년 뒤 그녀와 이혼했다. 그러나 실록의 행간을 살펴보면 그 이혼은 합의가 아닌, 송씨가 궁궐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난 모습을 하고 있다. 실록은 이 부분을 간단하지만 뭔가를 알 수 있게 적었다. '이때 영응대군의 부인 송씨가 병으로 인하여 내쫓기고, 다시 배우자를 고르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원문은 '時永膺大君夫人宋氏以疾見黜, 更爲擇配故云'이라고 돼 있다. 한문에서 '見'은 피동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見黜'(견출)은 쫓겨남을 당한 것이 된다. 사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시아버지 세종이 며느리의 행동거지에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병을 핑계로 막내아들과 강제로 이혼시키고 궁궐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송씨가 쫓겨날 당시에 병을 앓았다는 핑계는 얼마안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세종대왕은 곧바로 해주정씨 규수를 간택, 영흥대군과 그녀를 재혼시켰다. 여기부터 이른바 '조선시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송
- 조혁연 (2013.10.17 16:07:16)
- 0
- 7
-

왜 10살의 왕자를 초정약수까지?
1444년, 세종대왕은 청원 초정약수를 찾을 때 혈육으로 세자(후에 문종)와 영흥대군(永膺大君·후에 영응대군) 이염을 대동했다. 문종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흥대군은 지명도가 낮은 편이다. 때문에 세종대왕이 여러 명의 왕자 중 영흥대군을 왜 대동했는지는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당시 영흥대군은 10살밖에 되지 않았다. 세종대왕의 정비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는 세종과 사이에 40살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가 바로 영흥대군으로 여덟번째 아들이었다. 과거 다산이 대중화됐던 시절에는 막내 아들이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때문에 막내아들은 늘 '버릇없음'의 대명사가 되고는 했다. 영흥대군도 바로 그런 경우로, 세종의 사랑을 한껏 받았다. 세종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영흥대군을 아홉살때부터 사냥터에 데려가기도 했다. '여러 대군들도 모두 이리저리 달리면서 활을 쏘았다. 이때 영흥 대군 이염이 나이 바야흐로 아홉 살인데, 임금이 그를 대단히 사랑하여 만약 쫓기다 지친 짐승이 엎드려 있으면, 가던 연(輦)을 멈추게 하고서 사람을 시켜 염의 말을 그리로 몰게 하여 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막내아들 영흥대군을 위해 날다람쥐를 가져
- 조혁연 (2013.10.15 15:52:57)
- 0
- 7
-

하연 "너희는 그 영천을 마시겠구나"
고려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을 당하자 복주(지금의 경북 안동)로 몽진을 갔다가 귀로에 청주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이때가 공민왕 재위 11년인 1361년이다. 임금이 궁궐 안에 있으면 먼지를 뒤집어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피난을 위해 궁궐을 나서면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바로 '몽진'(蒙塵)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뜻으로, 그 자체로 난세를 의미하고 있다. 공민왕은 임시수도인 청주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자 과거시험을 실시, 그 합격자 명단을 취경루(지금의 망선루)에 붙이도록 했다. 그리고 지금의 청주 무심천 변에 있는 '공북루'(拱北樓)라는 큰 누각에 올라 호종한 신하들에게 시를 짓게 했다. 이날 시짓기에 참여한 대신은 모두 26명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종 때 사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당시 공북루에는 총 28편의 시편액이 걸려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날 공북루에서 지은 26편의 시 외에 1편은 그전부터 걸려 있었고, 또 다른 1편은 개성에서 보내온 백문보(白文寶?·∼1374)시였다. 즉 '26+1+1'인 셈이다. 1444년 봄, 세종대왕이 우리고장 초정약수를 찾았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방문중, 신숙주, 박팽년, 류
- 조혁연 (2013.10.10 16:21:46)
- 0
- 4
-

신숙주 "초정 건너편에는 복숭아꽃 마을"
1444년 2월 28일. 세종대왕이 우리고장 초정약수를 방문하기 위애 한양 도성을 떠날 때 조정 대신중 누구를 대동했는지 당일 기록에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다. 세종실록은 그날 기사를 '임금과 왕비가 청주 초수리에 거둥하니, 세자가 임금을 모시고 따라갔다'(上及王妃幸淸州椒水里 世子隨駕)라고만 적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초정약수에 1차(봄철)로 머물 때인 1444년의 3~5월 동안의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우의정 신개(申槪), 예조판서 김종서(金宗瑞), 판중추원사 성달생(成達生), 병조판서 정연(鄭淵), 영흥대군 이염(李琰), 도승지 이승손(李承孫) 등 6명의 대신과 1명의 대군 이름이 등장한다. 이중 영흥대군 이염은 세종의 8번째 아들로, 문종의 동생이 된다.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외에 세종을 호종(扈從), 즉 호위하며 뒤따라간 대신들은 더 있었다. 개인문집에 △초수리 △호종 △당시 풍경묘사 등의 내용이 등장하면 세종대왕을 호종한 신하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신숙주(申叔舟·1417~1475)가 그런 예에 해당하고 있다. 그가 남긴 문집으로 성종의 특명에 의해 편찬된 '보한재집'(保閑齋集)이 있다. 문집에는 '扈從淸州 次醴泉懸板 三首'(호종청주 차예천현판…
- 조혁연 (2013.10.03 17:13:10)
- 0
- 4
-

방문중, "향기로운 액체 삼농을 살리네"
조선시대 초수리 약수(초정약수)는 독특한 물맛 때문인지 뭇 문인들이 많이 찾았고, 그 느낌을 시로 남겼다. 사료에 등장하는 인물을 언뜻 적어도 신숙주, 서거정, 이승소, 방문중, 하연, 박팽년, 안평대군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초정약수를 직접 방문했는지, 아니면 소문만 듣고 시를 썼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위에 열거한 인물 모두는 세종연간에 생존했다. 따라서 세종과 함께 초정약수를 찾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평대군 등은 사료를 통해 직접 확인되고 있다. 열거한 인물 중 방문중(房文中)은 좀 특이한 인생 궤적을 지니고 있다. 그는 태종 때 과거에 급제했고 본관이 '남양'(지금의 수원)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을뿐 나머지 관직은 거의 기록돼 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곧은 성격에 패기가 만만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실록에 나타났다. 고대 중국에는 이른바 '일취구녀제'(一娶九女制)가 존재했다. 황제는 정비인 왕비를 포함해 9명을 후궁을 거느닐 수 있다는 뜻이다.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도 이 제도를 내심 크게 반겼다는 증거가 사료에 속속 존재하고 있다. 태종은 공식적으로 9명의 후궁을 둔 것으로 전해지나, 일부 사료는 17명까지 기록
- 조혁연 (2013.10.01 16:25:24)
- 0
- 4
-

63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지리산 '만복대'
가을의 기운이 만연한 지난 28일 '63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이 지리산 만복대에서 열렸다.회원 35명이 버스에 올라 3시간을 달려 지리산 성삼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만복대에 오르는 코스는 5.4km, 3시간가량이 소요된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 10승지 중 하나인 만복대는 지리산의 많은 복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넓은 억새초원과 2m 크기의 조릿대 군락, 철쭉, 찔레나무 등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만복대 산행길은 오름과 내림이 반복돼 초보산행객에게는 쉽지 않은 코스였다. 참가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발걸음을 옮겼다.얼마나 올랐을까. 참가자들은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언덕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큰 숨을 몰아쉰다.한걸음에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큰 숨 한 번에 마음속 복잡한 생각 등을 뱉어내며 자연의 상쾌함을 들이마셨다.길 양 옆에 자라난 대나무 잎과 옷깃을 스치며 자연을 몸으로 느낀다.가파른 오르막길에 힘이 부칠 때쯤이면 자연이 만들어놓은 작은 쉼터가 나타났다. 일행은 이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지리산의 모습이 산행의 별미다.산행 중 마주친
- 박태성 (2013.09.29 17:12:16)
- 0
- 9
-

김종서, "초수 솟구침은 상서로운 기운"
장자 추수편에는 상상속의 새인 봉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워낙 고결한 새이다 보니 함부로 먹지 않고 아무 곳이나 앉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릇 원추라는 봉황새는 남해를 출발하여 북해로 날아갈 적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으며 약수가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夫원추 發於南海而飛於北海 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飮)- 인용문중 '예천'(醴泉)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예천은 감천(甘泉), 즉 단맛이 솟는 샘이라는 뜻으로 태평성대에만 상서로운 기운이 솟구친는다는 전설이 있다. 이를 인용한 중국고전 예기는 '하늘에서는 단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예천이 솟아나는구나'(天降甘露 地出醴泉)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고려의 대문장가인 이규보도 비슷한 분위기를 시를 남겼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해도 하늘이 모른다면 / 어찌하여 예천이나 지초가 땅에서 나겠는가 / 백가와 천사를 모두 궁구해야 하지만 / 효경을 먼저 읽어 깊은 뜻 터득하여라.'- 효도로 가득한 세상이 되면 현세가 곧 '예천의 땅', 즉 낙원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호학군주로 다방면의 학자적인 경지에 올랐던 세종대왕이 '예천'의 의미를 모를리 없다. 그는 우의
- 조혁연 (2013.09.26 17:17:47)
- 0
- 4
-

신개 "초수는 단술보다 낫다"고 하지만
세종대왕이 탄 어가는 한양도성을 출발한지 닷새만인 1444년 3월 2일 청주목 초수리(초정약수)에 도착했다. 이때 신하들중 누가 세종대왕의 어가를 호종, 즉 뒤따랐는지 실록에는 명확히 기록돼 있지 않다. 이보다는 박팽년(朴彭年·1417∼1456)의 유고문집인 '박선생유고'에 여럿의 인명이 등장한다. 유고문집은 '世宗幸椒井。時河公演,李公塏,申公叔舟,崔公恒,黃公守身,李公思哲及安平大君等竝扈駕'이라고 기술했다. 해석하면 '세종이 초정에 거둥했다. 이때 하인, 이개, 신숙주, 최항, 황수신, 이사철 및 안평대군 등이 함께 어가를 뒤따랐다' 정도가 된다. 그러나 박선생유고에 빠진 인물이 있다. 바로 당시 우의정 신개(申槪·1374∼1446)이다. 그는 태조 이성계가 실록을 몰래(?) 보자고 할 때 그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할 정도로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 시대의 임금과 신하는 그 시대의 역사를 숨겨서 뒷세상에 전하였으므로, 호령(號令)과 언어·행동의 즈음에 이로 인하여 경계로 삼아 감히 그릇된 짓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사관(史官)을 설치한 뜻이 깊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사관이 자신을 어떻게 평했는지 무척 궁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말고 그 이전에
- 조혁연 (2013.09.24 18:24:03)
- 0
- 5
-
"가을철 산악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가을, 본격적인 등산철이 시작되면서 등산객의 '산악안전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 덕주사 부근에서 등산객 L(48)씨가 산행 부주의로 다리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같은날 오후 8시께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월악산에서 송이를 채취하러 나선 A(76)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23일 오후 7시 현재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23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07건으로 940명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9~10월 발생한 사고가 319건(28.8%), 232명이 구조됐다.가을철 산악사고는 초보 등산객의 산행이 늘고, 등산객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산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산행 전 충분한 준비운동 △산행 시 2인 이상 동행 △해지기 2시간 전 산행을 마무리 △발에 잘 맞고 방수능력이 좋은 등산화를 착용 △암벽 등 추락위험 지역에서는 반드시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행 중 체력소진에 대비해 열량이 높은 간식과 이온음료,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산행 중에는 입산통제 구역
- 박태성 (2013.09.23 17:28:16)
- 0
- 7
-

이규경 "초수물맛은 맵고 떫다"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관찰력은 초수리 약수(초정약수)의 위치성, 우물의 규모, 솟아오르는 모양 등 외형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 조선후기의 호기심 많은 지식인답데 그의 관찰력은 두루 넓었다. 이번에는 그의 오감 기능 중 맛을 보는 혀의 기능이 작동했다. 그는 처음 맛본 초수리 약수의 느낌을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試삽(睡에서 目대신 口)之。味微辛而澁。俄而舌尖乍辣。又如點礬。人言如露酒淡者。非誇也。或傳此泉有兩派。其味一淡一辣。同出一井。而味不相和。亦一異云。'- '시험삼아 초정약수를 맛봤다. 맛이 약간 매우면서 떫었는데 혀에서 갑작스런 매운 맛이 솟아올랐다. 동시에 그것은 명반과도 같은 맛이었다. 사람들이 露酒의 맑음같다고 말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혹간에 샘에는 2개의 수맥이 있어 그 맛은 하나는 담백하고 하나는 맵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은) 한 우물에서 동시에 나오나 그 맛은 서로 섞여지지 않아 역시 한결같이 다르다라고 전해진다.'(필자 번역) 초수리 약수의 물맛을 기록한 이규경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이중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辛'(매운 맛)은 '乍辣'(순간적인 매운 맛)에, 澁(떫은 맛)은 點礬(명반)
- 조혁연 (2013.09.12 18:21:26)
- 0
- 4
-

초정 옆에는 '柏樹'가 심겨져 있었다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은 오랫동안 저술활동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는 기록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의 역저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그의 교유 관계가 일부 나타난다. 그는 '사소절분편변증설'(士小節分編辨證說)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저서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변증'이라는 낱말은 '직관 또는 경험에 의하지 않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을 연구한다'는 뜻이다. '나의 조부 형암(炯菴, 이덕무 지칭)선생이 사소절 3권을 지었다. 그러나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로 전해왔는데 도성에 사는 최도사(崔都事) 성환이 편을 갈라 1권으로 하여 주자(鑄字)로 간행했다. (…) 1853년 가을에 서울에 있는 최한기가 내방하여 간행했음을 전하고 1854년 봄에 2질을 보내오니 옛 정분의 두터움을 알겠으며 그 감사함을 형용할 수 없다.' 인용문에 그가 교유한 최한기와 최성환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최한기(崔漢綺, 1803~1877)는 중국과 서양서적을 광범하게 섭렵한 후 개국통상론을 주장할 만큼 개혁적인 인물이었다. 최성환(崔·煥, ?~?)은 지도와 지리학에 해박하여 김정호와도 교분을 가졌으며, 이규경 역시 김정호의 뛰어난 능
- 조혁연 (2013.09.10 16:25:49)
- 0
- 4
-

실학자 이규경, 초정약수를 찾다
조선후기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있다. 그는 조선 제 2대 임금인 정종의 직계손이나 서자출신이었기 때문에 크게 등용되지 못했다. 때문에 그의 가문에는 집 안에서 대대로 전해져오는 학문인 '가학'(家學)이 발달했다. 이런 가풍은 그의 손자인 이규경(李圭景, 1788∼1863)에게로도 이어졌다. 그 역시 '한미한 양반가=가학'의 등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비주류 지식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조부 이덕무와 마찬가지로 국내는 물론 세계사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난 것이 조선후기 최대 백과사전의 하나로 불리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이다. 제목중 '오주'(五洲)는 '5대양 6대주' 할 때의 그런 오주로, 그의 관심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0권 60책의 방대한 이 백과사전은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6.25 때 소실됐다. 다행히 그 전에 필사해 놓은 것이 있어 지금껏 전해지고 있다. 이규경은 이 백과사전에서 청주목 초수리(초정)를 방문하는 과정과 그 당시 느낀 소감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놨다. 이 책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
- 조혁연 (2013.09.05 15:39:40)
- 0
- 4
-

경호실장, 초수리서 급사하다
중국 송나라는 文과 武중 文을 더 높이 샀다. 그러다 보니 국방력이 약한 편이었다. 고려도 송나라를 본받아 文을 숭상하고 武를 하대하는 이른바 숭문언무(崇文偃武) 정책을 실시했다. 고려 강참찬은 귀주대첩의 총사령관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무관이 아닌 문관 출신이다. 고려 문신들은 평소에는 붓을 잡고 있다가 유사시가 되면 전쟁을 지휘했다. 이는 나중에 무신란의 주요 원인이 됐다. 반면 조선은 개국한지 얼마 안 되 무과를 실시했다. 태조2년(1393)의 일로, 이때 장원 급제를 한 인물이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다. 무과 장원 제 1호인 셈이다. 실록이 이 부분을 자세히 기술해 놨다. '임오년에 나라에서 처음으로 무과를 설치하였는데, 달생이 제1등으로 뽑혀 대호군에 임명되고, 나가서 흥덕진병마사가 되었다. 무자년에 왜구들이 갑자기 근경에 침범하자 달생이 급히 이를 추격하매 왜구가 곧 달아났다. 태종이 어구마(御廐馬)를 하사하고 잔치를 열어서 위로하였다.'- 인용문의 '어구마'는 임금을 위해 궁궐 안에서 기르던 말을 일컫는다. 성달생은 그 어구마를 무과 수석의 선물로 받았다. 그는 이후 주로 궁궐의 경호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서 간혹 '경호실수'도
- 조혁연 (2013.09.03 15:36:31)
- 0
- 4
-
65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북한산 둘레길'
- 김희란 (2013.11.24 14:28:04)
- 0
- 8
-
초수리 행궁, 화염에 휩싸이다
- 조혁연 (2013.11.21 17:38:06)
- 0
- 4
-
극심한 가뭄…경호군을 돌려 보내다
- 조혁연 (2013.11.19 16:19:17)
- 0
- 4
-
"괴산 청안은 한국 조세사의 못자리다"
- 조혁연 (2013.11.14 16:16:08)
- 1
- 4
-
청안현을 대상으로 貢法을 실험하다
- 조혁연 (2013.11.12 16:24:33)
- 0
- 5
-
봄엔 한글, 가을엔 공법을 고민하다
- 조혁연 (2013.11.07 16:04:30)
- 0
- 4
-
'초수리에서 훈민정음에 급급하다'
- 조혁연 (2013.11.05 16:38:29)
- 0
- 7
-
당시 초수리 민가수는 38호였다
- 조혁연 (2013.10.31 17:42:12)
- 0
- 4
-
그해 심한 가뭄의 주범은 '높새바람'
- 조혁연 (2013.10.29 16:08:25)
- 0
- 4
-
64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통영 사량도'
- 최범규 (2013.10.27 18:15:59)
- 0
- 11
-
왜 초수리 玉의 발견에 열광했을까
- 조혁연 (2013.10.24 16:46:05)
- 0
- 4
-
"초수리 옥은 세상의 보배이다"
- 조혁연 (2013.10.22 17:42:49)
- 0
- 4
-
초수리 왕자, 첫사랑을 못잊어 하다
- 조혁연 (2013.10.17 16:07:16)
- 0
- 7
-
왜 10살의 왕자를 초정약수까지?
- 조혁연 (2013.10.15 15:52:57)
- 0
- 7
-
하연 "너희는 그 영천을 마시겠구나"
- 조혁연 (2013.10.10 16:21:46)
- 0
- 4
-
신숙주 "초정 건너편에는 복숭아꽃 마을"
- 조혁연 (2013.10.03 17:13:10)
- 0
- 4
-
방문중, "향기로운 액체 삼농을 살리네"
- 조혁연 (2013.10.01 16:25:24)
- 0
- 4
-
63회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지리산 '만복대'
- 박태성 (2013.09.29 17:12:16)
- 0
- 9
-
김종서, "초수 솟구침은 상서로운 기운"
- 조혁연 (2013.09.26 17:17:47)
- 0
- 4
-
신개 "초수는 단술보다 낫다"고 하지만
- 조혁연 (2013.09.24 18:24:03)
- 0
- 5
-
"가을철 산악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박태성 (2013.09.23 17:28:16)
- 0
- 7
-
이규경 "초수물맛은 맵고 떫다"
- 조혁연 (2013.09.12 18:21:26)
- 0
- 4
-
초정 옆에는 '柏樹'가 심겨져 있었다
- 조혁연 (2013.09.10 16:25:49)
- 0
- 4
-
실학자 이규경, 초정약수를 찾다
- 조혁연 (2013.09.05 15:39:40)
- 0
- 4
-
경호실장, 초수리서 급사하다
- 조혁연 (2013.09.03 15:36:31)
- 0
- 4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오는 30일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 개최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예술 거점 공간' 충북아트센터 건립 시동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실시간 댓글
- 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 세계종교가, 한나라때 동아시아에 보급된것입니다.@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
- 보다 야외에서 행해져 온 전통이 강합니다. 조상숭배는 실내의 廟와, 실외의 墓에서 복합적으로 거행해옴. 공자님제사는 성균관과 향교의 실내 사당에서 거행.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유교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해,달,별 숭배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발명한 황하문명 은나라때, 하늘로 승천하여 계절을 다스리시는 上帝숭배가 있었고, 주나라때, 天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은나라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께서 하느님(天)숭배와, 조상신이 되신 五帝숭배, 하위의 神明숭배 전통을 계승하시고, 인간의 도리를 설파하셔서, 유교라고 부르는 세
- 한나라이후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로 수천년.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유교는 하느님(天)과 日月星晨의 하위神, 山川의 神을 숭배하는 명절들이, 실내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의사분들 좀 자성하길! 의료진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껏 의사들 집단행동했던걸 기억하건데 자신들 밥그릇 챙기느라 행동했던거 아닌가?
- 사람이 두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신변비관? 참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경찰분들 그분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 안 하시고... 돌아 가신분들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삼천만원도 안되는데 아파트라 정말 좋은조건으로 들어간다고 기뻐했을겁니다 법을 몰라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용한 사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매거진 in 충북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