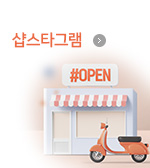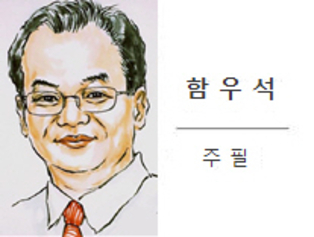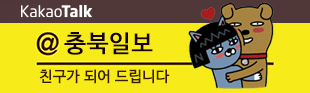용사와 같이 있으면 돌아가신 큰 형님 생각이 떠오른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용사의 연배와 비슷하다. 형님은 6·25 전쟁 때 적과의 접전이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 실탄과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백병전이 벌어져 인민군의 대검에 대퇴부를 찔려 후송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려서 들은 기억이 난다. 그래서 용사와 같이 있으면 큰 형님을 뵙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존경심도 우러난다.
어느 날 용사의 집을 방문한 네게 "국방부에서 뭘 좀 써 달라는데 쓸 줄을 알아야지" 하면서 내미는데 보니까 참전 수기를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반세기저편의 기억을 되살리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용사는 열아홉 살 때 군에 자원입대를 했다. 농촌에서 나고 자랐기에 그 기나긴 보릿고개 넘기가 어려워 밥만 먹여주면 무엇이든 할 자신이 있었다. 당시는 해방직후라서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져있었고 국군이 창설 될 때였다.
훈련은 무척 힘들고 엄격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용사는 물끄러미 허공을 응시할 때도 있었다. 완전군장을 하고 매일 40km 씩을 달렸으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자원한 군에서는 배불리 먹기는 고사하고 퍼들퍼들 날아 갈 것 같은 통 밀 삶은 것을 먹고 나면 소화도 되지 않을뿐더러 화장실에 가보면 멀겋게 그냥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용사가 6·25 전투에 참가했던 이야기를 할 때는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나는 군대를 가지 못했다. 신체검사 시에 내 체격은 남에게 비해 그리 뒤떨어지지 않았고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군의관은 을종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사실 당시는 군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겁쟁이였던 것도 사실이나 지금 생각해 보면 사나이로 태어나 군대에 갔다 오지 못한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격이 되고 말았다.
용사는 전투 했던 곳의 지명과 일자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에 메모라는 것은 신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했었지 농사짓다가 입영한 사람에게는 한갓 사치스런 행동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용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군부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6·25 전쟁 때 용사가 세운 혁혁한 전과로 무공훈장 수훈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전수되지 못하고 보관되어 있으며 6·25 기념일을 맞아 모 육군부대에서 전수할 계획이니 꼭 참석해달라는 부탁에 어리둥절했단다. 제대한 지가 50년이 넘었고 그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당시 받지 못한 훈장이 보관되어 있다니 꿈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용사는 그 날 참석해서 두 개의 훈장을 받아왔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훈장을 자랑스레 생각하고 있었다. 더구나 현역 생활을 하지 못한 나로서는 더없이 존경스럽고 부러운 것이기도 했다. 50여 년이 지난 옛일을 들춰내 전수해주는 당국과 군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느껴졌다.
용사의 이야길 듣고 있으면 끝이 없다. 어느 때는 눈 쌓인 험준한 산을 오르는가 하면, 분대원 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용사가 설치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대전차 지뢰를 매설한 이야기도 생생하다.
피아간의 공격이 치열할 때 용사는 육군하사의 계급을 달고 철원을 지나 개성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후퇴하다가 포위되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한다. 영하 20도 씩 내려가는 전방고지에서도 속내의를 모르고 살았으며, 얼마나 담대했는가는 전쟁이 없을 때 전우들이 용사를 가리켜 "총알이 무서워서 피해 가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순철 약력

동양문학 신인상 당선(1990년)
월간『수필문학』천료(1994년)
한국문인협회, 충북수필문학회 회원
수필문학충북작가회장,
충북수필문학회부회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충북수필문학상 수상 (2004년)외 다수
수필집『달팽이의 외출』『예일대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