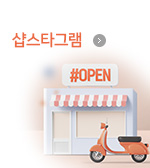전체기사
-

진천 소두머니, 그 독특한 지명의 유래와 이하곤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와 문백면 은탄리 사이의 하천에는 '소두머니'로 불리는 독특한 지명이 존재하고 있다. 한자로는 '牛潭'(우담)으로 적는다. 소두머니는 물이 맑고 깊은 가운데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마치 해수욕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또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은 산이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어 명승의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일대는 산의 끝이 용의 머리같이 생긴데다가 마치 내를 건너는 형상이라 하여 도용(渡龍)골로도 불리우고 있다. 진천군에서는 이같은 전설을 바탕으로 매년 농다리에서 '소두머니 용신놀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전설의 출처는 연담-은탄리 하천의 소두머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이같은 명승을 그냥 지나칠리 없다. 조선 순조-고종 연간의 인물로 정해필(鄭海弼·1831-1887)이 있다. 그는 송달수(宋達洙)의 제자로, '조암집'을 저서로 남겼다. 그가 이런 시를 남겼다. '깊은 물 맑고 푸른데 산을 뚫은 듯(一泓澄碧穿雲山) / 조그마한 배는 역류에서 가볍게 출렁이도다(漁·輕·溯中間) / 도인을 따르는 곳에 진정한 낙이 있구나(道人隋處得眞樂) / 반나절이나 고기떼 새떼 오락가락하는 한가로운 곳 왕래하도다(牛餉管來魚鳥閒)'. 청주대 정종진 교수는
- 조혁연 (2014.10.07 16:17:46)
- 0
- 4
-

18세기 청주읍성의 거리 풍경을 읊다, 이하곤
이하곤(1677-1724)의 장인 송상기는 대제학, 대사헌, 예조·공조판서 각 1번 그리고 이조판서를 무려 5번이나 역임하는 등 숙종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특히 그 전에 충주목사, 충청도관찰사 때 선정을 베푸는 등 우리고장과도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충주목사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여 백성의 일의 절급(切急)한 상황을 진달하고 청하기를, "한전(旱田)에 급재(給災)하고, 적곡(·穀)을 거두는 것은 3분의 1을 율(率)로 하며, 갑술년8709) 이전의 포흠은 한결같이 모두 탕척하고, 양진창(楊津倉)의 적곡은 전미(田米)로써 대봉하며…"'- 양진창은 충주읍성 북문 부근에 존재했던 국립창고를 말한다. 그러나 그는 신임사화 때 화를 입어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됐다. 경종(장희빈의 아들)의 건강이 악화되자 누구를 후계자로 옹립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소론과 노론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소론이 "노론이 왕권교체를 기도한 역모를 하고 있다"고 공격, 김창집·이이명·조태채·이건명 등 노론계 대신들이 대거 축출됐다. 이른바 신임사화로, 여기에는 이하곤의 장인 송상기도 포함돼 있었다. 이하곤은 장인 송상기가 당시 67살 노구의 몸으로 강진에 유배되
- 조혁연 (2014.09.30 15:36:14)
- 0
- 4
-

농장이 있던 괴산 낙영산도 자주 찾다, 이하곤
이하곤의 진천 두타산 아래로의 낙향은 여느 선비들과 다른 면이 있었다. 조선 선비들의 낙향은 일반적으로 은거, 안빈낙도 등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하곤의 낙향은 자연과 함께 숨쉬는 산수애호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는 유배중에 있는 장인 송상기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세상에 모든 화려한 영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연만을 바라보며 書史(서사)를 오락거리로 삼고 구름과 달을 좆으며 새와 물고기를 벗삼아 여생을 마치기만 바랄 뿐입니다.'- 문집 '두타초' 행간을 살펴보면, 이하곤은 47세(1723년·경종 3) 때 완전히 내려오기 전까지 진천으로의 낙향과 상경을 반복했다. 따라서 그의 중간 낙향은 엄밀한 의미로 '하향'(下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는 진천으로 하향하면 완위각 인근의 자가소유 누정 뿐만 아니라 지금의 괴산 청천면 낙영산을 즐겨 방문했다. 그리고 멀게는 남원 광한루와 장인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도 찾아갔다. 그는 그때마다 시와 산문을 남겼고, 그 자체가 '이하곤 개인史'가 되고 있다. 이하곤의 부친 이인엽은 주천(지금의 초평천) 가에 증조 오촌(梧村) 이대건과 조부 벽오(碧梧) 이시발의 호에서 하나씩 취하여 '쌍오정'(雙梧亭
- 조혁연 (2014.09.25 16:25:06)
- 0
- 6
-

이하곤, 중국 그림까지 소장하고 있었다
두타초 책 14에는 '題李一源所藏鄭선元伯輞川渚圖後'(제이일원소장정선원백망천저도후)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와 관련, 이하곤(李夏坤·1667-1724)과 친구 신정하(申靖夏·1681-1716)가 주고 받는 말로 먼저 이하곤의 말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 남의 집에 소장된 것도 반드시 내가 모아둔 후에야 그쳤소. 근래 그렇지 못하였으니 기호가 이미 쇠퇴했다고 생각했소.(…) 내 집의 완위각에 단지 수 십 폭의 옛그림이 있는데 근래 제인의 필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 이에 대해 친구 신정하는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느데 또 욕심을 내면 탐욕스러운 것'이라는 투로 답한다. '재대가 수장한 것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거두어 진천으로 돌아갈 때에는 수레에 실음 서화가 꼬리를 물고 길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도 이제 이 화첩에 대해 틈새를 보며 갖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많이 있으면서도 더욱 욕심을 내는 자입니다.' 인용문 중에 '이 화첩'이라는 표현, 제목 중에는 '鄭선元伯輞川渚圖後'라는 내용이 보인다. 바로 이 대화는 겸재 정선(鄭··1676∼1759)의 '輞川渚圖'라는 그림을 둘러싸고 이하곤이…
- 조혁연 (2014.09.23 15:58:06)
- 0
- 4
-

완위각, 어떤 책이 얼마나 장서돼 있었을까
이하곤의 낙향 의지 중심에는 역시 그의 진천 장서각인 '완위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완위각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장서돼 있었다. 아들 이석표(李錫杓·1704-?)가 아버지 이하곤을 추념하면 '담헌행장'을 지었다. 이렇게 적었다. "유독 서적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책을 파는 사람을 보면 심지어 옷을 벗어 책을 사니, 모아놓은 것이 거의 만권에 이르렀다. 위로는 경사자집에서 아래로는 패관소설, 의서, 점술서, 불가서, 도가서 등에 이르기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다." 행장은 죽은 사람의 문생이나 친구, 옛날 동료, 아니면 그 아들이 죽은 사람의 성명, 관향(貫鄕)·관작(官爵)·생졸연월·자손록 및 평생의 언행 등을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인용한 문장 중에 '만권'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증조부인 이시발(李時發·1569-1626)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낙상지(駱尙志)에게 고서 수 천권을 받았다'는 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서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종손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700여책을 조사한 결과, 증조부 이시발의 장서인(藏書印)이 찍힌 것은 단 1권이고, 나머지 모두는 이하곤의
- 조혁연 (2014.09.18 18:00:15)
- 0
- 7
-

오래 전부터 진천 낙향을 갈망하다, 이하곤
이하곤의 진천 낙향은 스승 김창협에 대한 변무소(옹호하는 소) 사건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와 관련 실록에는 두 유형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전 부솔 이하곤은 명가의 자제로서 언론과 행동을 더욱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인데, 흉당(凶黨)과 일을 같이할 수 없음과 외척과 연명(聯名)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 사론에 속아 따랐으니, 사부의 수치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 당시 정원 조지빈(趙趾彬)이 아뢰는 말이다. 인용문의 포인트는 '외척과 연명할 수 없음을 생각하지 않고'라는 문장에 있다. 당시 소론의 영수 최석정(崔錫鼎)은 이하곤과 가까운 촌수가 된다.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했다. 그러나 즉위 3년차의 경종은 병이 깊어 정사를 돌보지 못할 상황이었고, 그런 까닭에 권력은 이미 노론 쪽으로 넘어가 있었다. 조지빈이 외척을 걸고 넘어진 것은 그 같은 권력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 인용문에는 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인 사론(史論)도 등장한다. 이렇게 썼다. "일찍이 김창협(金昌協)을 사사하였기 때문에 그 소에 참여하였던 것이며, 처의하는 데는 실수함이 없었다. 당시 상황에 개탄하며
- 조혁연 (2014.09.16 17:08:27)
- 0
- 4
-

이하곤이 진천으로 낙향을 꿈꾼 이유는
담헌 이하곤(李夏坤*1677-1724) 집안이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일대에 세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증조부 이시발(李時發·1569-1611)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시발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두타산 아래의 땅을 하사받았다. 이시발은 지금의 청주 오근장 출신으로, 서계 이득윤 밑에서 수학했다. 조부 이경억(李慶億·1620-1673)과 부친 이인엽(李寅燁·1656-1710)도 잇달아 급제, 벼슬이 좌의정과 대제학에 이르는 등 명문가 명성을 이어갔다. 이하곤은 1677년(숙종 3) 서울에서 부친 이인엽과 모친 임천조씨와의 사이에 3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담헌은 문중 농장이 진천에 있는 까닭에 서울과 진천을 자주 오르내렸다. 두타초 등 그가 남기 문집을 보면, 담헌은 그의 나이 25살, 29살 때 진천을 일시적으로 찾았고, 35살 때는 가족을 거느리고 하향했다. 담헌은 이때부터 초평 일대를 거주지로 삼았고, 완위각도 이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그가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32세 되던 숙종 34년(1708)에 과거에 응시, 진사과에 장원 급제했다. 그러자 담헌에게는 '익위사세마', '세자익위사부솔' 등의
- 조혁연 (2014.09.11 16:23:26)
- 0
- 5
-

진천 완위각, 금간옥자(金簡玉字)를 상징한다
조선후기 문인이자 미술평론가인 이하곤(李夏坤·1677∼1724)은 우리고장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양촌마을에 사설 도서관의 일종인 완위각(宛委閣)건립하고 엄청난 양의 책을 보관했다. 완위각은 달리 만권(萬券)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뜻에서 '만권루'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완위각에는 이하곤이 수집한 당시 고서화류도 많이 보관돼 있었다. 따라서 완위각은 서적을 단순히 수집하고 장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선비들의 문화적 공간이었다. 특히 강화학파로 불리는 소론계 인사들이 많이 찾았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건물 이름을 짓는데 적지 않은 정성을 쏟았다. 자신의 철학, 아니면 중국 고사에 관련해 작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완위각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그것도 bc 2천년 무렵의 중국 하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사는 아니지만 중국 사서 중의 하나로 '오월춘추'(吳越春秋)가 있다. 이 사서에 따르면 하우씨(우임금 지칭)는 자주 찾아오는 홍수를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을 하다 황제중경이 지은 책을 보게 됐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다. '구의산(九疑山) 동남에 하늘기둥처럼 완위산(宛委山)이 있는데 적제(赤帝)는 그 산 위의 궁궐에 살고…
- 조혁연 (2014.09.04 16:57:41)
- 0
- 4
-

추석 상차림, 노론계 안에도 갑론을박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우리 선조들은 망자의 죽음을 두 번 확인했다. 바로 '고복'(皐復) 또는 '초혼'(招魂)으로 불리는 부르는 의식이다. 전통시대에는 임종을 마치면 고인의 옷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아가거나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고인의 성명을 왼 다음 복~ 복~ 복~ 자를 긴소리로 세번 불렀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전통장례식 때도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이 '해동조선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복~복~복~'이라고 외친 바 있다. 복!복!복 할 때의 복은 한자 '돌아올 復' 자 이다. 즉 육체를 떠나 북쪽으로 가고 있는 혼령에게 미안한 마음에, 죄스런 마음에 다시 돌아오라는 간절한 주문을 담고 있다. 제사나 차례에서는 '북쪽'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바로 '북쪽'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북망산', '북망산천'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나왔다. 제사나 차례 지낼 때는 지방이나 신주가 모셔지는 방향이 '북쪽'이 된다. 차례도 제사의 일종이나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제사는 특정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고, 차례는 자신이 모시는 모든 조상을 명절날 한꺼번에 모신다는 점이 다르다. 또 제사는 돌아가신 날 자시(11시~
- 조혁연 (2014.09.02 18:00:36)
- 0
- 4
-

조선시대 제천에는 '청초호'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 단반령과 명성황후 시해에 분노한 백성들이 유생을 중심으로 봉기했다. 그 유명한 을미의병으로, 우리고장 제천지역도 중심지의 하나였다. 제천출신 의병중에 정운호(鄭雲灝·1862~1930)라는 인물이 있다. 제천지역 명군가의 종손이었던 그는 34세 나이로 유인석의 제천의병에 가담했다. 그는 문재가 뛰어나 의병에 투신하기 전에 고향 제천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제천팔경'이라는 칠언율시를 지었다. 팔경시의 제목은 '의림지 낚시하는 늙은이'(林湖釣·), '백련사 돌아가는 중'(蓮寺歸僧), '대암의 노니는 물고기'(·巖遊魚), '관란정의 우는 여울'(瀾亭鳴灘), '한벽루 가을 달'(碧樓秋月) 등이다. 나머지 세 개의 시는 '능강의 봄 돛단배'(綾江春帆), '옥순봉 기암'(玉筍奇巖), '월악산 늦단풍'(月岳晩楓) 등이다. 이중 제 5경시인 '한벽루 가을달'은 다음과 같은 운율로 일대 풍광을 노래했다. '물 가까이 한벽루는 비취빛을 둘러 희미하게 보이고 / 맑은 하늘 밝은 달은 가을을 따라 돌아가네 / 가을바람 불어 명주(明酒)에 그림자를 만들고 / 옥로(玉露)는 빛을 더해 객의 옷을 씻누나 / 청초호(靑草湖) 밝아 물고기 헤아릴 만하고 / 금병
- 조혁연 (2014.08.28 16:41:36)
- 0
- 4
-

증평 '죽이리'가 '원평마을'로 바뀐 사연
증평군 증평읍 '죽리'는 행정구역상 '죽1리'와 '죽2리'로 나뉘어져 있었다. 지금은 '죽1리는 '죽리', 죽2리는 '원평마을'로 부르고 있으나 법정지명은 여전히 '죽리'이다. 이곳 지명이 '대竹' 자의 '죽리'가 된 사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4년 일대를 대나무가 많은 동네라는 뜻으로, 죽리(竹里)로 작명했다. 이후 인구수가 늘면서 법정명은 '죽리' 그대로 유지됐으나 행정명은 '죽1리'와 '죽2리'로 분화됐다. '죽2리'. 문자로 표기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소리로 호칭하면 다소 심각한 현상이 발생한다. 문법상 '죽이다'에서 파생한 '죽이리'에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지(will)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어디 살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죽이리 삽니다"라고 답을 하면, 상대방은 난감해 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06년 죽리(竹里) 주민 중 죽2리 마을대표 임태정 씨가 증평군청을 방문해 "죽1리와 죽2리를 한자로 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죽일리'와 '죽이리'가 돼 어감이 않 좋다"며 개명을 희망했다. 그 결과, 행정명은 앞서 언급한대로 '죽리'와 '원평마을'로 바뀌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일제가…
- 조혁연 (2014.08.26 16:48:14)
- 0
- 5
-

'푸르름'을 끌어들이다, 괴산 존빈루
조선시대 충북지역 대부분의 지역에는 고을을 대표하는 누정(樓亭)이 존재했다. 청주에는 망선루, 충주 경영루, 단양 이요루, 황간 가학루, 청풍 한벽루, 음성 의송정, 옥천 적등루, 진천 연정(蓮亭), 보은 삼산루, 청산 백운정, 문의 사산루, 괴산 존빈루 등이 유명했다. 이들 누정에는 한시도 함께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인문학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괴산 존빈루(尊賓樓)에는 조선전기 서거정과 쌍벽을 이뤘던, 우리고장 충주출신의 이승소(李承召·1422 -1484)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제목은 '괴산의 존빈루에서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槐山尊賓樓次板上韻)이다. 차운(次韻)은 타인의 시에 화답하면서 운자(韻字)를 그 차례대로 두며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장정에다 단정까지 모두 거쳐 지나오니(過盡長亭與短亭) / 푸른 산속 깊은 곳에 외로운 성 하나 있네(翠微深處有孤城) / 높은 누각 뾰족하여 하늘 바람 내려오고(高樓矗矗天風下) / 가는 비는 자욱하여 작은 시내 생겨나네(細雨··澗水生).- 철언절구인 이 한시는 비교적 길어 뒷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진다. '한들대는 버들가지 묘한 춤춰 보여주고(柳拂腰肢呈巧舞) / 눈썹 같이 비낀 산은 한가한 정 자
- 조혁연 (2014.08.21 13:57:53)
- 0
- 7
-

좌구산 본래 '坐龜山', 증평군지만 '개狗' 자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시대 대부분의 고문헌은 증평 좌구산의 한자를 '거북이 앉아 있는 모습의 산'이라는 뜻으로 '坐龜山'이라고 기록했다. '좌구산은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坐龜山在縣南十里)- 이때의 고을은 지금은 증평읍에 밀려 면이 된 청안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헌은 좌구산의 한자를 '개 狗' 자를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평군지는 '아버지 김치와 관련이 있다'고 그 유래를 적었다. '김치는 광해군의 폭정이 심해지자 칭병을 하고 좌구산 아래 밤티골(율리)로 낙향했다. 어느 날 김치에게 심기원(沈器遠)이라는 인물이 찾아와 능양군(후에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데 거사 일자를 점쳐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치가 목욕재개하고 점을 쳐보니 성공하는 괘가 나왔다.'- 이어지는 내용은 '김치를 포함한 일행 모두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동편 좌구산에서 개가 세번이나 크게 짖었다. 이에 일행은 누군가 염탐하런 온 것을 눈치채고 현장을 피했고, 그래서 인조반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후 김치는 이 산을 개가 짖음으로 큰 일이 성공했다는 뜻에서 개 狗 자의 좌구산으로 부르도록 했다'라고 적었다. 이 구전은 △김치가 점을 매우 잘 쳤고 △인조반정에 간접적
- 조혁연 (2014.08.19 17:43:00)
- 0
- 5
-

잠깐 존재했던 동자석, 문인석에게 패배하다
망자(亡者)의 공간인 무덤을 부르는 명칭은 능(陵)·원(園)·총(塚)·분(墳)·묘(墓) 등 다소 다양하다. 능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 원은 세자나 세자비 또는 왕의 종실무덤을 일컫는다.총은 규모가 크고 어떤 특이한 유물이 출토됐지만 매장자, 즉 묘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붙인다. 가령 금관이 나왔으니까 '금관총'으로 부르는 경우다.분은 옛무덤이지만 특이함이 발견되지 않는 평범한 무덤을 가리킨다. 이때는 지역명을 따서 'OO리 몇호분'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 이것 외의 평범한 무덤은 '묘'(墓라)고 불렀다.증평읍 율리 산 8-1에 백곡 김득신(金得臣·1604-1684)과 그의 아버지 김치(金緻·1577-1625)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묻힌 김득신은 생전에 아버지 묘를 살피기 위해 좌구산 아래 율리(밤티골) 산길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는 밤티골이 배경이 된 '율협'(栗峽)이라는 칠언절구다.'산기슭 시냇가에 돌로 만든 대(山畔溪頭石作臺) / 올라서 바라보니 석양이 눈앞에 펼쳐지네개(登臨斜日兩眸開) / 시흥이 일어나 자주 붓을 들며(詩因有興頻抽筆) / 근심을 덜기 위해 빈번히 술잔 기울이네(酒爲銷愁每把盃) / 나그네의 혼은 꿈속에서
- 조혁연 (2014.08.12 17:26:02)
- 0
- 4
-

팔순에 명화적 칼에 희생…숙종도 큰 관심
증평 율리 삼거리에서 좌구산 방향으로 달리면 삼기저수지가 나오고, 여기서 더 진행하면 율리 마을회관이 나타난다. 이 마을 뒷산에 백곡 김득신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증평군청 자료는 백곡의 묘에 대해 '김치(김득신 부친)의 상여가 좌구산과 구녀산 사이로 난 분젓치(옛 영남통로)를 넘어 한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상여의 만장이 날아가서 이곳에 앉는지라 명당이라고 생각한 후손들이 이 자리에 묘를 썼다'고 구전을 옮겨 놓았다. 김득신 묘의 봉분은 높이 1.6m이고 묘지둘레는 20m로, 봉분 앞에는 상석과 묘비석, 동자석이 놓여있다. 김득신 묘 바로 위에는 조선 중기 최고의 주역 연구가이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아버지 김치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 부자는 한남금북정맥 최고봉인 좌구산 산록에서 나란히 영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김득신은 17세기 인물치고는 꽤나 장수한 편이었다. 생몰연대가 '1604∼1684년'이니까, 약 80년 동안 생존했다. 이와 관련, 증평군지는 백곡에 대한 설명문 말미를 '저서로 백곡집(栢谷集)·종남총지(終南叢誌)가 있다. 유학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했다. 묘소는 증평군 증평읍 율리에 있다'라고 의외로…
- 조혁연 (2014.08.07 15:18:05)
- 0
- 4
-

취묵당 주련시, 필화사건을 겪다
괴산읍 농촌리 괴강가에 자리잡고 있는'취묵당'에는 누정 이름을 적은 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취묵당 중수기'와 '취묵당' 단어가 들어간 한시가 걸려 있어 이 누정이 취묵당임을 알게 한다. 취묵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통칸마루 사방에 난간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4개의 기둥에는 '용호'라는 주련(柱聯) 시가 걸려 있다. 주련은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로, 기둥(柱) 마다 시구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기복덕(生氣福德), 덕담(德談) 등의 내용을 붓글씨로 써서 붙이거나 그 내용을 얇게 새겨서 걸기도 한다. 또 오언이나 칠언의 유명한 시나 자작한 작품을 써서 거는 경우도 많다. 한 구절씩을 적어 네 기둥에 걸면 시 한 수가 완성된다. 취묵당에 걸린 백곡의 주련시 '용호'의 내용이다. '고목에는 찬 안개가 감돌고(古木寒煙裏) / 가을 산에 소나기 흩뿌리네(秋山白雨) / 저무는 강물에 풍랑이 일어나니(暮江風浪起) / 어부는 서둘러서 뱃머리를 돌리누나(漁子急回船).- 18세기 인물인 안정복(安鼎福·1712∼1791)은 이 시에 대해 '효종이 "당인(唐人)에게 부끄럽지 않다"며 화공을 시켜 이 시를 써주고는 대
- 조혁연 (2014.08.05 17:58:39)
- 0
- 5
-

별빛이 괴강가 선궁(仙宮)에 떨어지다
팔영(八詠)은 8곳의 경치를 읊었다는 뜻이다. 김득신이 '괴협취묵당팔영'의 제 1, 2영에서 일대의 서경을 노래했다면 제 3영은 생활의 정감을 노래했다. '우리 집은 강위에 있는데 / 문밖에 상선이 정박했네 / 달 밝은 백사장에 닻을 내리고 / 안개 낀 옛 골짜기에 돛을 내렸네 / 한수(漢水) 입구에서 바람을 타고 가 / 탄금대 곁에서 노를 두르리네 / 내일 고기와 소금을 팔면 / 촌민들 수 없이 모이겠지.'- 김득신의 생활공간이자 창작 장소인 취묵당 앞의 괴강으로 서해안 상선(商船)이 거슬러 올라와 소금과 고기를 팔고 있다. 인용문 중 '한수'(漢水)는 남한강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도 괴산 불정면 목도강변에서는 백중이 되면 매년 황포돛배의 정박 행사가 재현되고 있다. 제 3영은 그것을 문헌적으로 고증하는 시로 봐야 할 것 같다.제 4영은 괴강가에서 밤중에 물고기 잡는 모습이 마치 소설을 쓰듯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의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십분 발휘된 시로 볼 수 있다. '오래된 나루의 어부들의 횃불 / 초저녁부터 밝게 빛나네 / 여울머리에선 잠든 해오라기 놀라고 / 물 밑에선 물고기 숨고 달아나네 / 반딧불은 백사장 가에서 반짝이고 / 별빛은 선궁(仙
- 조혁연 (2014.07.31 15:29:42)
- 1
- 4
-

괴강 모래톱으로 석양이 지다
김득신은 괴강가의 취묵당짓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창동(蒼童)을 시켜 작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큰 소나무만 남겨두며, 작은 돌은 뽑아내고 큰 돌은 끊으며 썩은 흙은 제거하여 더러온 고을을 청소하니 기이한 형세와 경치가 번갈아 나타났다. 사람들은 모두 이곳엔 마땅히 당우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청당태수에게 청해 목수를 얻어 재목으로 쓸 약간을 베어서 두 칸 당을 지었다.'- 인용문 서두의 창동은 청년같은 소년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괴산임에도 불구하고 청당(청안현) 태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다소 이채롭다. 백곡은 이렇게 완성된 취묵당을 통해 멀고 가까운 곳의 경치를 확보했고, 이에 크게 만족해 했다. '성불산이 잇달아 솟아 있는 것, 남녘과 동녘까지 이어진 교외, 이탄 광탄의 급류, 물가에 늘어선 나무, 어촌마을이 벌려 있는 것, 구름이 일어나고 새가 날아가는 것, 고리가 노릴고 사람이 다니는 것이 모두 시야에 들어오니 소원이 이뤄진 것이다. 기쁘기가 예쁜 선녀가 손톱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만 같은 뿐만 아니다.'- 김득신은 처음에는 괴강으로의 낙향 생활에 불안함을 보였으나 얼마안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일대 근·원경을 소재로…
- 조혁연 (2014.07.29 17:24:12)
- 0
- 4
-

"북강이 그립구나", 괴강생활 처음에는 부적응
김득신의 문집인 백곡집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만날 수 있다. '괴강에 머문 지 4년이 넘는데, 철에 따라 경물로 시를 지으니 시주머니가 넉넉하네'(槐江泥滯四年强 時物供詩富錦囊). '명성을 다투고 이익을 탐함은 내 일이 아니니, 괴강에 돌아가 모래밭에 앉아 낚시질하리'(爭名貪利非吾事 歸去槐江坐釣沙).그는 취묵당 주변의 괴강가 일대를 철따라 다양하게 시의 소재를 얻을 수 있는 공간, 명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곳 등으로 표현했다. 다음 시도 백곡이 괴강가를 봄날의 흥취에 마음껏 젖을 수 있는 곳, 또 뒷산이 되는 개향산을 빼어난 명승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괴협에 봄기운이 돌아 홀로 돌아오니, 시골 흥취가 느긋하여 막을 수 없네'(春生槐峽獨歸來 野興悠悠不可哉). '꿈 속의 넋이 또한 개향산의 빼어남을 알아, 울긋불긋한 벼량을 밤마다 올라가네'(夢魂亦識香山勝 翠壁丹厓夜登). 그러나 김득신이 처음부터 괴강가 일대를 마음의 안주처로 흡족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취묵당과 초당을 지어 은거를 시작한 뒤에도 벼슬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음이 그의 시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출처는 모두 백곡집이다. '이 몸이 어찌
- 조혁연 (2014.07.24 17:49:55)
- 1
- 4
-

소금배에 잔도, 17세기 괴산지역 생활상 생생
김득신은 여러 정황상 목천현 백전(栢田·지금의 천안신 병천면 가전리)에서 태어나 20대까지 보냈고, 그 이후는 한양에서 생활한 것으로 여겨진다. '병자피난초작'(丙子避難初作)이라는 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난리통에 한 번 서울 집 떠나온 뒤로 / 홀로 깊은 시름 안은 채 삼처럼 어지럽구나 / 깊은 골짜기 쌓인 음기에 봄이 더디니 / 작은 매화가 추위에 움츠려 피지 못하네 /.../ 홀로 하늘가 한 구석에 떠도는 이 내 신세 / 병란에 소식 끊기어 깊은 시름만 안고 있네 / 두 장모와 최모 박모 친구들 잘 있는지 / 서로 만난다면 한스러움 금방 그칠텐데 /.../'- 김득신은 그의 나이 32살 때 병자호란(1636년)을 만나 영남지역으로 피난했다. 이 시는 그때 지은 흔치 않은 장시(長詩)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뒤에 이어진다.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그해 겨울 영남지방에 눈이 무척 많이 왔음을 알 수 있다. '듬성한 수풀 너머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 푸른 절벽에 기댄 절간이 있나보다 / 아이놈과 함께 찾아가려 하지만 / 봄눈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 어이하리 / 멀리 서울서 온 나그네 / 이별의 정한 가누기 어렵구나 / 이 산 어디에서 봄빛을 찾을꼬 / 찬 골짝…
- 조혁연 (2014.07.22 17:19:09)
- 0
- 4
-

한 칸 집을 지어 경치를 독차지하다
백곡 김득신은 괴강이 내려다보이는 개향산 언덕에 취묵당을 건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활공간인 초당(草堂)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풀 草' 자에서 보듯 이때의 집은 사대부가의 격식을 갖춘 것이 아닌, 작고 허름한 초가로 여겨진다. 김득신이 초당과 관련해 남긴 글은 당시 괴산지역 공간과 자연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먼저 그가 남긴 '초당서'에는 광탄, 방간야, 성불산, 한림, 장군 등의 명사가 등장한다. '성황당 서쪽 광탄 북쪽의 方干野(방간야)와 더불어 성불산이 펼쳐진 곳에는 언덕이 쓸쓸하지만 한림의 옛집이 있고, 남은 터가 활량하지만 장군의 옛 자취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사는 연기는 끊어졌지만 풍월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인은 천석고황(泉石膏亡+月)과 운림질고(雲林疾痼)가 있어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붉은 먼지를 떠나니 초헌과 면류관에는 관심이 없고 강호에 백발을 비추며 낚시질함이 소원이다.'- 인용문 중 '한림'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부친 김치, '장군'은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조부 김시민을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성불산은 현재도 유통되는 지명으로 괴산 서쪽의 해발 530m 산을 지칭하고 있다. 근래 현 임각수 괴산군
- 조혁연 (2014.07.17 16:31:41)
- 0
- 4
-

누정의 이름이 왜 '醉默堂'(취묵당)일까
누정의 본래 기능은 취경(取景), 즉 경치를 모으는데 있다. 때문에 전통 누정은 방이 없는 대신 마루만 있고, 사방이 두루 보이 듯이 탁 트였다. 누정에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 누(樓)·정(亭)·당(堂)·대(臺)·각(閣)·헌(軒) 등의 이름이 붙으나 그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 누정의 명칭은 자연, 동식물, 사람 호칭, 역사적인 사건 등과 관련된 것이 많다. 우리고장을 위주로 예를 들면,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의 금호루(錦湖樓)는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동물과 관련된 누정 명칭으로는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의 관어대(觀魚臺)가 있다. 조선 중기의 인물인 민욱(閔昱·1559-1625)은 이곳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뜻에서 '관어대'로 이름지었다.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의 가학루(駕鶴樓)는 누각이 학의 날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구전되고 있다. 추풍령 정상에서 승용차를 타고 북쪽으로 달리다 보면 언덕 위의 전통건물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학루다. 사람 호칭과 관련된 누정으로는 애한정(愛閑亭)과 백석정(白石亭)이 있다. 괴산읍 검승리에 위치하고 있는 애한정은 조선 현종 때 괴산군수였던 황세구(黃
- 조혁연 (2014.07.15 15:01:49)
- 0
- 7
-

늦은 나이 과거합격, 출세의 발목을 잡다
김득신은 현종 3년(1662) 문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과 합격생에 걸맞는 직책을 갖지 못하고 성균관 학유(學諭)라는 한직에 임명됐다. 학유는 성균관 소속으로 각종 과거응시의 예비심사일을 처리했고, 태종 때부터는 성균관입학시험에 대한 예비심사도 하였다.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개국 때인 태조 연간에 처음 설치됐다. 학유는 보기에 따라 유생의 사표(師表)가 되는 자리였다. 때문에 세종 때에는 문행(文行)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고 대간(臺諫)의 동의를 얻은 뒤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유는 정치적인 권력이 발휘되는 관직은 아니었다. 김득신이 한직에 임명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정황상 회갑을 목전에 둔 나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李玄錫)이라는 인물이 쓴 김득신의 묘갈명(비석문)을 보면 그는 이 즈음 우리고장 괴산의 괴강가로 낙향, 그 유명한 취묵당(醉默堂)을 짓는다. 현재 괴산읍 능촌리 김시만장군 사당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취묵당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통칸마루에 사방 난간에 설치돼 있다. 지난 2007년 도문화재자료 제 61호로 지정됐다. 묘갈명 등을 참고하면 김득신은 괴강가 우거생활 중에 장령에 임명되나 이번
- 조혁연 (2014.07.10 17:56:44)
- 1
- 5
-

환갑을 목전에 둔 59세에 과거 합격을 하다
김득신(金得臣·1604∼1684)의 어릴적 이름은 '자공'(子公)이고, 호는 백곡(栢谷)이다. 백곡이라는 지명은 언뜻 김득신의 만년 우거공간이었던 괴산 어느 잣나무(栢) 골짜기(谷) 쯤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같은 이름인 진천 백곡을 떠올릴 수 있으나 두 곳 지명과는 무관하다. 김득신의 호 백곡은 목천현 백전(栢田) 마을을 의미하고 있다. 지금의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다. 백곡의 고조부 김석은 1519년 기묘사화 때 괴산으로 피신했다. 그후 증조부 김충갑이 서원에 유배되었다가 목천현 백전마을에 살던 장인 이성춘(李成春)의 전장을 물려받아 그곳에 정착했다. 그는 목천에 거주하면서 선영이 있는 우리고장 괴산을 왕래했다. 김득신의 아버지 김치(金緻)도 1901년부터 4년 동안 선영의 일 때문에 괴산 방하현(方下峴)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난다. '취묵당일기'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 '선친이 괴산 방하연에 들어와 4년 동안 머물면서 묘지를 돌봤다.'(先君入槐州方下峴 留四年爲丘墓矣) 방하연은 백곡이 나중에 취묵당을 세운 괴산읍 능촌리 일대를 일컫는다. 김득신의 과거시험 준비는 생활터전이 있는 백곡에서 주로 이뤄졌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크게 소과와 대과
- 조혁연 (2014.07.08 18:11:52)
- 0
- 5
-

독서하는 눈빛이 종이를 뚫을 정도였다
선조~숙종 연간을 산 인물인 김득신(金得臣·1604∼1684)은 조선 최고의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김득신이 말년을 보낸 괴산 괴강가의 취묵당(醉默堂)에는 그의 독서량을 기록한 '독서기'(讀書記) 편액이 걸려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어떤 책의 독서가 끝나면 그 횟수를 대나무에 새겨 기록으로 남겼다. 취묵당 독서기를 보면, 김득신의 사기의 백이전(伯夷傳)을 1억 1만 3천 번으로 가장 많이 읽었다. 반면 노자전(老子傳)·분왕(分王)·벽력금(霹靂琴)·주책(周策)이라는 책은 2만 번을 읽었다고 기록했다. 또 제책(齊策)·귀신장(鬼神章)·목가산기(木假山記)·중용서(中庸書)는 1만 8천 번, 송설존의서(送薛存義序)·송원수재서(送元秀才序)·백리해장(百里奚章)은 1만 5천 번을 읽었다. 이밖에 획린해(獲麟解)·사설(師說)·송고한상인서(送高閑上人序)·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承廳壁記) 등은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썼다. 이상의 글을 모두 합하면 36편이 된다 억이나 만 단위 숫자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나, 그가 조선 최고의 독서광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의 독서 방법은 다독과 정독이었다. 그는 많이 읽기도 했지만 정독을 병행했다. 이런 김득신의 독서방법을 주위에서
- 조혁연 (2014.07.03 15:21:47)
- 0
- 6
-
진천 소두머니, 그 독특한 지명의 유래와 이하곤
- 조혁연 (2014.10.07 16:17:46)
- 0
- 4
-
18세기 청주읍성의 거리 풍경을 읊다, 이하곤
- 조혁연 (2014.09.30 15:36:14)
- 0
- 4
-
농장이 있던 괴산 낙영산도 자주 찾다, 이하곤
- 조혁연 (2014.09.25 16:25:06)
- 0
- 6
-
이하곤, 중국 그림까지 소장하고 있었다
- 조혁연 (2014.09.23 15:58:06)
- 0
- 4
-
완위각, 어떤 책이 얼마나 장서돼 있었을까
- 조혁연 (2014.09.18 18:00:15)
- 0
- 7
-
오래 전부터 진천 낙향을 갈망하다, 이하곤
- 조혁연 (2014.09.16 17:08:27)
- 0
- 4
-
이하곤이 진천으로 낙향을 꿈꾼 이유는
- 조혁연 (2014.09.11 16:23:26)
- 0
- 5
-
진천 완위각, 금간옥자(金簡玉字)를 상징한다
- 조혁연 (2014.09.04 16:57:41)
- 0
- 4
-
추석 상차림, 노론계 안에도 갑론을박
- 조혁연 (2014.09.02 18:00:36)
- 0
- 4
-
조선시대 제천에는 '청초호'가 있었다
- 조혁연 (2014.08.28 16:41:36)
- 0
- 4
-
증평 '죽이리'가 '원평마을'로 바뀐 사연
- 조혁연 (2014.08.26 16:48:14)
- 0
- 5
-
'푸르름'을 끌어들이다, 괴산 존빈루
- 조혁연 (2014.08.21 13:57:53)
- 0
- 7
-
좌구산 본래 '坐龜山', 증평군지만 '개狗' 자
- 조혁연 (2014.08.19 17:43:00)
- 0
- 5
-
잠깐 존재했던 동자석, 문인석에게 패배하다
- 조혁연 (2014.08.12 17:26:02)
- 0
- 4
-
팔순에 명화적 칼에 희생…숙종도 큰 관심
- 조혁연 (2014.08.07 15:18:05)
- 0
- 4
-
취묵당 주련시, 필화사건을 겪다
- 조혁연 (2014.08.05 17:58:39)
- 0
- 5
-
별빛이 괴강가 선궁(仙宮)에 떨어지다
- 조혁연 (2014.07.31 15:29:42)
- 1
- 4
-
괴강 모래톱으로 석양이 지다
- 조혁연 (2014.07.29 17:24:12)
- 0
- 4
-
"북강이 그립구나", 괴강생활 처음에는 부적응
- 조혁연 (2014.07.24 17:49:55)
- 1
- 4
-
소금배에 잔도, 17세기 괴산지역 생활상 생생
- 조혁연 (2014.07.22 17:19:09)
- 0
- 4
-
한 칸 집을 지어 경치를 독차지하다
- 조혁연 (2014.07.17 16:31:41)
- 0
- 4
-
누정의 이름이 왜 '醉默堂'(취묵당)일까
- 조혁연 (2014.07.15 15:01:49)
- 0
- 7
-
늦은 나이 과거합격, 출세의 발목을 잡다
- 조혁연 (2014.07.10 17:56:44)
- 1
- 5
-
환갑을 목전에 둔 59세에 과거 합격을 하다
- 조혁연 (2014.07.08 18:11:52)
- 0
- 5
-
독서하는 눈빛이 종이를 뚫을 정도였다
- 조혁연 (2014.07.03 15:21:47)
- 0
- 6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오는 30일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 개최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예술 거점 공간' 충북아트센터 건립 시동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실시간 댓글
- 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 세계종교가, 한나라때 동아시아에 보급된것입니다.@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
- 보다 야외에서 행해져 온 전통이 강합니다. 조상숭배는 실내의 廟와, 실외의 墓에서 복합적으로 거행해옴. 공자님제사는 성균관과 향교의 실내 사당에서 거행.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유교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해,달,별 숭배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발명한 황하문명 은나라때, 하늘로 승천하여 계절을 다스리시는 上帝숭배가 있었고, 주나라때, 天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은나라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께서 하느님(天)숭배와, 조상신이 되신 五帝숭배, 하위의 神明숭배 전통을 계승하시고, 인간의 도리를 설파하셔서, 유교라고 부르는 세
- 한나라이후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로 수천년.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유교는 하느님(天)과 日月星晨의 하위神, 山川의 神을 숭배하는 명절들이, 실내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의사분들 좀 자성하길! 의료진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껏 의사들 집단행동했던걸 기억하건데 자신들 밥그릇 챙기느라 행동했던거 아닌가?
- 사람이 두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신변비관? 참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경찰분들 그분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 안 하시고... 돌아 가신분들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삼천만원도 안되는데 아파트라 정말 좋은조건으로 들어간다고 기뻐했을겁니다 법을 몰라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용한 사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매거진 in 충북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