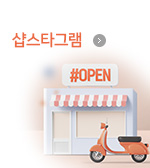전체기사
-

세종대왕 길,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다
세종대왕은 눈병 치료를 목적으로 1444년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우리고장 초정약수를 찾았다. 조선의 7대 임금이자 세종의 아들인 세조도 그로부터 20년후 초정약수를 찾았다. 세조가 초정약수를 찾은 것 역시 치료 목적이었으나 병명은 달랐다. 조선시대에는 가려운 증상의 피부병을 '아양'이라고 불렀다. 세조는 이 '아양' 치료를 위해 충청도 순행에 나섰다. 세조는 권력 찬탈 과정에서 조카 단종과 동복동생 안평·수양대군을 죽인 까닭에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학계에서는 '가지가 저절로 올라갔다'는 정이품송 전설도 정통성 시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 각종 야사도 세조가 얻은 피부병을 그의 정통성 시비와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대충 이런 식이다. '세조의 꿈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자신을 꾸짖었다. "네가 내 자식을 죽이니 나도 네 자식을 죽이겠다"라며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사라졌다. 이후 세조의 맏아들인 덕종이 잠을 자다가 가위눌림으로 비명했고, 세조는 피부병을 얻었다.' 피부병 치료를 위한 세조의 충청도 순행은 1464년 1월 하순부터 시작됐다. 당시 조정은 이와 관련한 '특별 경계령'을 충청병영에 내렸다. '충청도
- 조혁연 (2014.02.25 15:30:25)
- 0
- 4
-

67차 클린마운틴, 대청호둘레길 1구간
추위가 한풀 꺾인 2월의 마지막 주말,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아카데미 회원들은 대청댐 둘레길을 걸으며 겨우내 움츠렀던 몸과 마음을 녹였다.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67차 충북일보 클린마운틴 참가자 40여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대청댐으로 향하면서 올해 첫 클린마운틴의 막을 올렸다. 올해로 8년째 이어지는 클린마운틴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산 쓰레기 줍기 운동'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왔다. 우리 지역의 둘레길을 돌면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를 줍고 우리 둘레길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명품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오전 9시30분께 청원군 문의면 현암정 휴게소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받고 기념촬영을 한 뒤 걸음을 옮겼다. 이날 코스는 현암정을 시작으로 구룡산, 현암사, 문의대교, 청소년수련원, 문의향교로 이어지는 구간이었다. 천천히 여유를 갖고 자연을 즐기자는 클린마운틴 아카데미의 모토에 맞춰 참가자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길을 걸었다. 오전 9시50분께 구룡산 현암사에 오른 회원들은 잠시 쉬면서 물안개가 자욱한 대청호의 모습에 넋이 나갔다. 이어 1시간 가량 들쭉날쭉한 돌계단과 가파른 산길을 거쳐 구룡산 정상에 오르자 나무로 만든 용이
- 임영훈 (2014.02.23 17:49:32)
- 0
- 11
-

충청감사 윤현, "조선 제1의 호조판서"
조선시대 호조(戶曹)는 조세, 부역, 인구 등을 담당했던 관서로, 그 수장은 지금의 경제장관에 해당하는 호조판서(정2품)다. 각종 문헌은 조선시대 최고의 호조판서로 충청도관찰사도 역임한 윤현(尹鉉·1514-1578)을 자주 기록했다. '윤현이 비용을 아끼고 보관해 두는 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각사에 오래 묵어 썩고 깨진 물건들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여, 창고에 저장해 두었었는데 뒤에는 모두 쓸 데가 있었다. 일찍이 사옹원에서 깨진 사기 그릇을 거두어다가 저장하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웃었다.'- 이 인용문의 악센트는 뒤에 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비웃었지만, 그 비아냥은 곧 탄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후에 궁성을 수리하게 되자 단청 물감을 담을 그릇이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그 깨진 사기 그릇을 내어다 나누어 주니 사용하기에 넉넉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진나라 도간(陶侃)이 나무 톱밥을 사용하게 했던 것보다도 훌륭한 일이라고 하였다.'- 중국 동진의 무장인 도간은 배를 만들다 남은 나무 톱밥과 대나무 조각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지만 곧 요긴하게 사용됐다. 나무 톱밥은 눈이와 진창이
- 조혁연 (2014.02.20 14:37:20)
- 0
- 4
-

'제증청주인'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요즈음 안부 어떠시냐고 물으신다면(近來安否問如何) / 달이 비친 사창에서 저의 恨도 많답니다.(月到紗窓妾恨多) / 만약 꿈속에 다닌 길 자취가 있다면(若使夢魂行有跡) /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겁니다.(門前石路半成沙)'- 이옥봉의 대표적 한시 작품인 '꿈속의 넋' 정도로 해석되는 '몽혼'(夢魂)이 있다. 전회에 여러번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어학자 이종문 계명대 교수는 '몽혼'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한국한문학연구 제 47집에서 제기했다. 논문의 제목은 '이옥봉의 작품으로 알려진 한시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선 중기의 문신은 윤현(尹鉉·1514-1578)의 '국간집(菊磵集)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한시의 제목이 우리 고장 지명의 '題贈淸州人'이다. '人間離合固無齊 / 忍淚當時愴解携 / 若使夢魂行有跡 / 西原城北摠成蹊.'-
- 조혁연 (2014.02.18 19:07:41)
- 0
- 4
-

강원도, 옥봉詩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다
'허난설헌과 함께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손꼽히는 이옥봉 시인의 삼척과의 인연과 작품세계를 조명하자는 문화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옥봉(李玉峰)은 당시 충북 옥천군수인 이봉(李逢)의 서녀로 태어나 출가했다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詩)를 짓는 것으로 고독한 세월을 보내던 중 삼척부사를 지낸 조원(趙瑗)의 첩으로 살면서 삼척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2011년 8월 30일자 기사 내용이다. 우리고장 옥천 출신의 이옥봉은 의 기사 내용대로 첩 신분으로 남편 조원을 따라, 1583~1586년 3여년 동안 삼척에 기거했다. 이옥봉은 이 기간동안 삼척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죽서루'와 '춘사'(春思)라는 한시를 남겼다. 시 '죽서루'는 매우 짧은 시이기는 하나, 하늘과 땅을 한 지점에서 조망하는 등 입체적인 풍광을 그리고 있다. '강물에 몸담근 갈매기의 꿈 드넓기 그지없고(江涵鷗夢闊) / 하늘에 든 기러기의 시름은 길기만 하구나(天入·愁長).' '강물'과 '하늘', '갈매기'와 '기러기' '꿈'과 '시름', '드넓고'와 '길기만' 등의 시어에서 보듯 이 시는 뚜렷한 대구(對句)를 하고 있다. '죽서루'는 서애집, 청창연담, 일사유사 등에 이옥봉의 작품으로 수
- 조혁연 (2014.02.13 17:22:03)
- 0
- 4
-

한시 잘 짓는 솜씨, 중국까지 알려지다
실학자 이덕무는 이옥봉의 한시를 "부녀자로서 대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다"라고 호평했다. 그녀 또한 자부심이 대단, 정실부인 아들에게 준다는 뜻인 '증적자'(贈嫡子)라는 시를 남겼다. '묘한 재주 어릴 적부터 자랑스러워(妙譽皆童稚) / 동방에 우리 모자 이름 날렸네(東方母子名) / 네가 붓을 대면 바람이 놀라고(驚風君筆落) / 내가 시를 지으면 귀신이 운다네(泣鬼我詩成).' 인용문의 '묘한 재주 어릴 적부터 자랑스러워'는 정실 아들의 글짓기 솜씨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뒷문장은 '우리 모자 이름 날렸네'로 돼 있다. 옥봉 자신도 그에 못지 않게 문재(文才)가 뛰어나다는 의미다. 다음 구절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옥봉은 정실 아들의 글솜씨에 대해 '네가 붓을 대면 바람이 놀란다'라고 칭찬한다. 반면 자신의 글솜씨는 '내가 시를 지으면 귀신이 운다'라고 더 자찬(自讚)했다. '읍귀'(泣鬼)는 '읍귀신' 즉 '귀신도 울린다'는 뜻으로, 중국 당나라 시인 하지장(賀知章* 659-744)이 이태백의 시를 보고 극찬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도…
- 조혁연 (2014.02.11 17:05:50)
- 0
- 4
-

한시 '괴산군수가 되신 운강공께'를 짓다
우리고장 옥천 출신의 여류시인인 이옥봉(李玉峰·?-?)을 소실(첩)로 맞은 조원(趙瑗·1544-1595)은 수재형 인물이었다. 그는 명종대에 진사시에 장원 급제하였고, 선조대에는 별시 문과에도 급제하였다. 이 부분은 전회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시문에도 능해 빼어난 한시를 많이 남겼다. 그가 지은 시중에 '별원즉사(別院卽事)'가 있다. 봄날의 서정이 잔물결이는 물가를 지켜보듯, 시각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묘사돼 있다. '정원의 실바람에 제비 나직이 날고(庭院微風燕影低) / 배꽃 핀 방초 언덕엔 새들이 지저귀네(梨花芳··鳥啼) / 담 모퉁이에 지는 해 의당 늦은 봄이라(墻頭落日宜春晩) / 행원 서쪽에 붉은 꽃 요란히도 나부끼리(·亂飄紅杏苑西)'- 조선후기 실학작의 한 명으로 이덕무가 있고, 그는 '청정관전서'를 저술했다. 그는 이 문집에서 "이 시는 마치 만당(晩唐)의 시체(詩體)와 같다"고 평했다. 생소한 표현인 '만당'은 중국 당(唐) 나라의 말년의 시를 초당·성당·중당·만당 등 4시기로 구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중 만당은 문종 이후 당말에 이르는 시기를 일컫는다. 조원의 시가 당나라 말기의 한시를 닮았다는 뜻이다. 조원의 시중 위와 같은 분위기를 풍
- 조혁연 (2014.02.06 15:54:38)
- 0
- 4
-

글 잘짓는 남자의 첩이 되길 원하다
우리고장 옥천 출신의 조선시대 여류시인인 이옥봉( 李玉峰·?-?)은 어머니가 천인이었지만 그녀의 몸에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봉(李逢, 1526~?)은 양녕대군의 고손자로, 호는 자운(子雲)이다. 그녀는 이런 혈통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지녔고, 그같은 심리는 한시로 나타났다. 그녀 대표작의 하나로 '영월도중'(寧越道中)이 있다. 글자 그대로 강원도 영월을 가는 도중에 지은 한시다. '닷새는 강을 끼고 사흘은 산을 넘으며(五日長干三日越) / 슬픈 노래 부르다 노릉의 구름에 끊어졌네(哀詞吟斷魯陵雲) / 이 몸 또한 왕손의 딸이니(妾身亦是王孫女) / 이곳의 두견새 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此地鵑聲不忍聞).'- 인용한 내용 중에 '노릉'과 '이몸 또한'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노릉은 노산군(魯山君) 즉 단종(端宗)의 능을 의미하고, '이몸 또한'은 자신도 그런 핏줄이라는 점을 강한 자의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녀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내용이 각종 자료에 공통적으로 서술돼 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시적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역시 문재(文才)를 갖춘 남성를 따르고자 했다. 그 결과, 조원이라는 인물의 문재가 대단함을 알고 그의 소실
- 조혁연 (2014.02.04 13:26:18)
- 0
- 7
-

'옥천의 여자 정지용'으로 불러도 될 듯
조선시대 여류문인으로는 신사임당, 허난설헌 등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에 못지 않은 여류 시인으로 16세기 인물인 이옥봉( 李玉峰·?-?)이 있다. 조선의 남성 지식인들은 그의 작품을 매우 호평했다. 권응인(權應仁·1517-?)은 '송계만록에서 "옥봉의 시는 청원장려(淸圓壯麗)하여 부인의 손에서 나온 것 아닌 듯 매우 가상하다"라고 평했다. 인용문 중 '청원장려'는 맑고 모나지 않으며, 힘이 있으면서 아름답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허균(許筠·1569∼1618)도 학산초담에서 비슷하게 평가, "이옥봉은 그 시가 몹시청건( 淸健)하여, 거의 아낙네들의 연지 찍고 분 바르는 말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건'은 맑으면서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녀는 다양한 내용의 시를 남겼으나, 특히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운율로 잘 표현했다. 일반인에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 서예대회 시제로도 자주 등장하는, '꿈속의 넋' 정도로 해석되는 '몽혼'(夢魂)이 있다. '요즈음 안부 어떠시냐고 물으신다면(近來安否問如何) / 달이 비친 사창에서 저의 恨도 많답니다.(月到紗窓妾恨多) / 만약 꿈속에 다닌 길 자취가 있다면(若使夢魂行有跡) /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
- 조혁연 (2014.01.28 17:39:38)
- 0
- 4
-

남겨진 가족들,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다
연좌제(連坐制)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좌제에 대한 동양 삼국의 첫 기록은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를 쓴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역사 50인의 모략가 중 한 명으로 진(秦)나라 상앙(商革+央)이 있다. 그는 국민을 10호·5호로 조직하여, 그 중 1인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냈다. 이른바 십오지제(什伍之制)다.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연좌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미 조선전기부터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세종대 이효관(李孝寬)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외할아버지 죄에 연좌되어 극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당시 의정부가 이렇게 아뢴다. '대체로 죄인의 친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부가(夫家)를 따라 면죄하거늘, 하물며 효관(孝寬)은 외손(外孫)으로서 연좌되었사오매, 실로 근거가 없다 하겠으니, 바라옵건대…'- 1884년.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주도한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났다. 그러자 고종과 민씨 일족은 즉각 연좌제를 발동, 개화파 가족에 대한 치죄에 나섰다. 이때 김옥균의 생부인 김병태와 양부인 김병기는 삭탈관직
- 조혁연 (2014.01.23 16:25:37)
- 0
- 7
-

김옥균 시신, 옥천 청산에 매장됐었을까
현재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의 묘는 일본 동경시내 아오야먀(靑山) 외국인 묘역과 진정사(眞淨寺) 경내, 그리고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3개의 무덤은 나름의 사연을 지니고 있다. 1894년 3월 28일. 김옥균이 중국 상해에서 암살됐다는 소식이 일본열도에 전해지자 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兪吉, 1835-1901)를 중심으로 '김씨장의위원회'가 구성돼 장례가 치뤄졌다. 그러나 아오야마 묘는 김옥균 시신이나 의복이 매장되지 않은 단순 '위패묘'이다. 대신 묘비명은 존재하고 있고, 이를 지은 사람은 유길준(兪吉濬,·1856∼1914)이다. '오호, 비상한 재주를 품고 비상한 때를 만나 비상한 공이 없이 비상한 죽음이 있었다. 시체는 고굴에 돌아갔어도 사지가 찢기는 욕을 당하였구나.'- 김옥균을 존경한 일본인 중에 카이군지(甲斐軍治)라는 사진사가 있다. 그는 1881년 김옥균을 처음 만난 이후 최후까지 정신·물질적으로 지원한 인물로, 자신이 죽을 경우 "김옥균 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정도였다. 김옥균의 묘를 동경 진정사에 조성한 인물이 바로 카이군지이다. 1927년 조선거류민단은 '청물어'(淸物語)라는 책자를…
- 조혁연 (2014.01.21 15:27:10)
- 0
- 7
-

사지의 하나, 충주에서도 효시되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주장했다면, 김옥균은 '삼화주의'(三和主義)를 추구했다. 두 사상의 명칭은 다르지만, 한·중·일 삼국이 공존공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균은 삼화주의에 대한 첫 번째 실천으로 당시 청나라 실력자인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을 만나고자 했다. '百千의 호위가 있어도 죽을 때에는 죽는다. 인간 만사가 운명이다. 虎穴에 들어가지 않으면 虎子를 얻을 수 없다. 이홍장이 나를 속이고자 하여 겸양한 말로 맞이하며, 내가 그를 속이고자 하여 그 배를 탄다. 그쪽으로 가고 즉시 죽음을 당하거나 幽人(유배 지칭)된다면 즉각 끝이다. 5분이라도 담화의 시간을 준다면 내 것이다.'- 전집을 쓴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은 중국혁명을 열렬히 지지했던 인물로, 김옥균의 또 다른 일본내 후견자이기도 했다. 인용문 중에 '그쪽으로 가고 즉시 죽음을 당하거나 幽人된다면 즉각 끝이다'라는 독백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이는 김옥균 자신도 중국 상해행에 대해 내심 매우 불안해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옥균과 몸종 격의 와다 엔지로(和田延次郞), 그리고 홍종우 등은 1894년 3월 23일 여객선 사이쿄마루(西京丸)을 타고 고베항 출발, 3일 후 중국
- 조혁연 (2014.01.16 16:27:58)
- 1
- 13
-

죽어서야 남편 곁으로 다가가다
옥천으로 피신한 김옥균의 부녀를 서울로 최종적으로 데려온 사람은 같은 개화파였던 박영효로 알려져 있다. 동학군의 기세가 충청도와 호남을 휩쓸 무렵 '이윤고'(李允曰+木)라는 사람이 옥천으로 찾아온다. 그는 김옥균이 1차로 일본을 갔을 때 통역으로 따라갔던 인물로, 제자이기도 했다. 그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던 일본군을 따라 우리고장 충북에 들어왔다가 두 모녀를 만나게 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된 행동으로 그 뒤에는 박영효가 있었고, 박영효는 뒤에는 일본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兪吉·1835-1901)가 있었다고 관련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쿠자와의 부탁을 받은 박영효가 이윤고에게 김옥균 부녀의 근황을 알아보도록 시킨 것이 된다. 현재 일본 1만엔권 지폐에는 인물 도안이 그려져 있다.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로, 일본 내에서는 근대화 주역의 한 명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그는 김옥균이 차관을 얻으러 일본을 갔을 때는 물론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양아버지이자 후견인 역할을 했다. 그는 메이지 천왕의 스승이면서 현재 동경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게이오대학의 전신인 '난학숙'을 세웠다. 현재의 산케
- 조혁연 (2014.01.14 14:41:36)
- 0
- 5
-

김옥균 부인과 딸은 왜 옥천으로 피신
김옥균의 부인은 기계 유씨(兪氏)로 두 사람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김옥균이 1884년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 후 일본으로 망명할 당시 슬하에 7살 난 딸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1870년대 중·후반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옥균과 박영효 등은 전투가 벌어진 창덕궁을 탈출, 인천항에서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망명했다. 부인 기계유씨와 딸도 연좌제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시아버지 김병태(金炳台)가 살고 있는 우리고장 옥천으로 피신했다. 김옥균의 생부 김병태가 당시 옥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김옥균의 정변 동지였던 정납이란 인물이 쓴 '옥주유고'(沃州遺稿)에 등장한다. 옥주를 지금의 옥천을 말한다. 정납은 이 유고에서 '김옥균의 처 유씨가 옥천 관노로 있을 때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쓴 것으로, 바둑연구가 이청 씨가 '김옥균 통신'이라는 글에서 밝힌 바 있다. 유씨가 한때 옥천관노가 됐다는 것은 피신해 왔다가 신분이 탄로난 것을 의미한다. 주한일본공사관은 김옥균 부인의 행방이 묘연하자 정보망을 총력 가동했다. 주한일본공사관 임시대리공사인 스기무라(杉村濬)는 1894년 6월 8일자…
- 조혁연 (2014.01.09 14:58:20)
- 0
- 4
-

옥천 출신설, 왜 자꾸 거론될까
고종과 민씨 일가의 수구파들은 갑신정변 때 당한 치욕을 곱씹고 있었다. 고종은 김옥균(金玉均·1851-1894) 암살을 위해 칼잡이(자객)를 거푸 일본에 밀파했다.1885년에 장은규(張殷奎·일명 장갑복 또는 장응규), 1886년에는 지운영(池雲英·1852-1935)을 몰래 보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김의 암살에 실패했다.장은규는 평민출신으로, 고종의 아들(의화군, 후에 영친왕)을 낳았다는 이유로 명성황후(민비)에게 미움을 받아 궁중에서 쫒겨난 장상궁의 오빠다. 그는 한때 충주 노은면에 살았던 민응식의 주선으로 고종에게 접근해 1만5천엔의 행동자금을 받고 김옥균 암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는 김옥균을 한번 만난 후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금을 물쓰듯 하며 환락에 빠졌다. 당시 일본경찰은 '요시찰 거동' 제목의 정보문건을 통해 "장은규는 나가사키의 게이샤(유녀)를 첩으로 삼아 고베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외무대신에게 보고했다.본관이 충주인 지운영은 종두법 시행의 선구자인 지석영의 친형으로, 국내 제 1호 사진사이기도 하다. 그는 1882년 수신사 일행으로 간 일본에서 사진술을 익혀 훗날 고종의 초상화용 사진을…
- 조혁연 (2014.01.07 15:48:46)
- 0
- 4
-

청주 이승우씨, 김옥균 바둑판을 발견하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준동하면서 최근의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흡사 구한말 같다는 표현이 적지 않다. 구한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조선 말기의 정치가이자 개화운동가인 김옥균(김玉均·1851∼1894)이다.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이 단행된 지 2갑, 즉 120주년이 되지만 김옥균 서거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풍운아 김옥균은 일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조선을 '갑신정변'(1884년)이라는 매우 급진적인 방법으로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 했다. 고종실록은 우정국 낙성식장에서 일어난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김옥균 등이 생도 및 장사들을 시켜 좌영사 이조연. (…) 내시 유재현 등을 앞 대청에서 죽이게 하였다. 상께서 연거푸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하교하시는 말씀이 있기까지 하였으나, 명을 듣지 않았다. 이때 상의 곁에는 김옥균의 무리 십수 명만이 있었는데, 상이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하였고…'- 이 부분은 고종이 사실상 유폐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다. 민씨로 대표되는, 수구파의 도움 요청을 받은 청나라 위안스카이는 1천5백명을 이끌고 창덕궁을
- 조혁연 (2014.01.02 15:24:15)
- 0
- 4
-

세종이 하사한 책, 청주목 학문발달 기여
대성동에 위치한 청주향교는 이른바 5성, 송조6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5성은 공자, 맹자, 안자, 증자, 자사자를, 송조 6현은 송나라 주자 등 6명을 말한다. 18현은 설총, 최치원, 정몽주, 정여창, 안유, 김굉필, 이언적, 조광조, 김인후, 이황, 성혼, 이이, 조헌, 김장생, 송시열, 김집, 박세채, 송준길 등이다. 청주향교는 역사적으로 10세기쯤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성종은 즉위 2년(983)에 청주, 충주 등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이같이 밝혔다. "진실로 백성들의 희망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우서(虞書·요순시대 지칭)의 12목(牧) 제도를 본받아 지방관들을 설치하였노니, 주나라의 국운이 8백년간 계속 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운이 장구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때 청주, 충주 등 전국 12목에 향교도 함께 설치되면서 중앙에서 경학박사가 파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회에 세종대왕이 1444년 청주 초수리로 거둥했을 때 통감훈의·성리군서·근사록·통감강목·유문(柳文)·한문(韓文)·통감절요·집성소학·사륜집 등 9권의 책을 하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책은 역사물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유교적인 내용이다. 통감훈의는…
- 조혁연 (2013.12.26 16:09:19)
- 0
- 4
-

세종, 신간을 청주향교에 하사하다
누군가가 직지를 만든 고려 금속활자가 중세 정보화 혁명을 불러왔다고 말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검증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독일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인쇄술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활자를 이루는 문자 자체가 자모음의 분리가 가능한 소리문자이기 때문에 대량 인쇄가 가능했다. 구텐베르크는 이를 바탕으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출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고려, 조선 등 우리나라의 전통시대 식자층이 사용하던 문자는 자모음의 분리가 불가능한 한자였기 때문에 조합되지 못하면서, 원천적으로 대량 인쇄는 불가능했다. 가령 어떤 책에서 1만개의 한자 활자가 필요하다면 그에 버금가는 활자를 일일히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같은 동북아시아 문자환경 때문에 역사의 발전이 이뤄졌다는 조선 중기에도 책은 여전히 매우 귀한 존재였다. 중종은 책이 워낙 귀하자 책을 관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이를 베껴(필사) 보관하도록 명령한다. "우리 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옛사람이 전해준 서책이 없지 않을 것이다. 관청에 소장된 서책 이외에 서책을 납입하는 자에게는 상을 후히 주게 하고, 만약 하나뿐인 책은 관에서 필사한 다음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게 하라. 이렇게…
- 조혁연 (2013.12.19 16:15:06)
- 0
- 4
-

청원 송천서원과 여말선초의 최유경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대략 3가지 설이 존재한다. 첫째 추천석 설화다. 충청도 진천에는 양순한 추천석이, 반면 경기도 용인에는 심술많은 동명이인의 추천석이 살았다. 이에 염라대왕이 심술많은 용인의 추천석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으나 사자는 엉뚱하게 진천의 추천석을 잡아왔다. 따라서 생환시키려 했으나 진천의 추천석은 이미 장례를 치른 뒤였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용인의 추천석을 잡아와 진천 추천석의 혼을 넣어 환생시킨 후 용인에서 살게 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설화다. 두번째는 개가한 여인에 대한 설화다. 이 여인은 개가 전에는 진천에 살았으나 남편과 사별하자 용인에 살면서 역시 아들을 낳았다. 이후 양쪽이 서로 모실려고 하자 관가에서 "어머니 생전에는 진천에서 모시고, 죽은 후에는 용인에서 제사로 모셔라"라고 판결했다. 세번쩨 설은 진천과 용인의 자연환경에서 비롯됐다. 진천은 예로부터 미질(米質)이 좋기로 유명하다. 반면 용인은 산세가 순후에 풍수적으로 명당이 많다고 소문나 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묘소도 용인에 위치한다. 그래서 생겨난 표현이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것
- 조혁연 (2013.12.17 16:17:14)
- 0
- 4
-

충북출신 포로들, 귀국길에 오르다
'자유한인보' 제 7호에는 충북을 주소로 두고 있는 포로 수용자들이 정확히 63명 등장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당시 청주군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영동 11명, 옥천 6명, 제천·보은 각 4명, 괴산군 3명 등의 순이다. 이중 오창면 주소자가 무려 12명이나 되는 점은 향후 학계가 연구해볼 대목이다. 도내 출신을 포함한 당시 3천명의 조선인 징병자들은 주로 남양군도(南洋群島)라는 곳으로 끌려갔다. 남양군도는 마샬, 마리아나, 캐롤라인, 길버트, 뉴기니아 등 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는 여러 개의 섬을 일컫는다. 1940년대 미국과 일본간에 벌어진 전쟁을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핀, 하와이 그리고 남양군도 등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미국은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작전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이후 전열을 다시 갖추면서 1943년에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이후 제해권을 되찾기 시작했다. 1943년 11월에는 남양군도의 하나인 길버트 섬, 1944년 2월에는 먀살군도, 6월에는 사이판 섬에 상륙해 일본군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전선에 배치됐던 우리나라 징병자들도 대거 미군의 포로로 잡히게 됐다.
- 조혁연 (2013.12.12 15:55:51)
- 0
- 4
-

자유한인보 포로명단, 3호 것이 아니다
얼마전 지역 한 일간지가 '자유한인보 제 3호' 발견을 보도했다. 자유한인보는 태평양 전쟁 때 미군에게 포로로 잡힌 우리나라 사람들 3천명 가량이 하와이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제작한 주간 소식지를 말한다. 한국인 포로들은 1년 6개월의 포로생활을 하면서 제 7호까지 소식지를 만들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제 3호 복사본이고 마지막 호인 제 7호는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종전과 함께 종간된 '자유한인보'에는 미국 하와이 포로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 등이 기록돼 있다. 가령 제 3호에는 당시 함께 포로생활을 하던 이탈리아 포로들과 축구시합을 했고, 그 결과 3대 5로 졌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밖에 귀국하면 어떤 나라를 건설한 것인가, 또 미군에 대한 고마움 등의 내용이 실려있으나 이중 후자는 다소 의외다.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적국에 대해 고마움을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상 맞지 않는다. 당시 미군은 한국 포로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 징병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한국인 포로 3천여명은 8명이 한 조가 돼 천막에 수용돼 있었다. 즉 당시 하와이 지역에는 한인 포로를 수용한 천막이 3백70여동 가량 들어서 있던 셈이다. 난민
- 조혁연 (2013.12.10 17:35:57)
- 0
- 4
-

조선시대 충주와 회인의 인구 차이
조선시대 수령들이 임지에 나가서 힘써야 할것으로 7가지가 있었다. 이른바 '수령칠사(守令七事)'로, 여기에는 '호구증(戶口增)'도 포함돼 있다. 인구를 많이 늘리라는 뜻이다. 나머지 칠사는 농상(農桑)을 성하게 할 것, 학교를 일으킬 것, 군정을 닦을 것, 부역을 균등하게 할 것, 소송을 간명하게 할 것, 서리의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고칠 것 등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구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봤느냐는 점이다. 경국대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무릇 구타로 태아가 사망한 것과 수태후 90일 초과한 것으로 형체가 이뤄진 것이면 타태죄(구타에 의한 낙태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수태후 90일 이내로 태아의 형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타상해로 논죄하지 타태죄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상에서 보듯 90일 전의 태아는 사람 형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닌 '잠재적인 인간'으로 인식했다. 전통시대 역대 권력자 중 임산부를 가장 이해한 임금은 세종이었다. 정말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종은 노비가 임신을 했을 경우 노비부부 모두에게 출산휴가를 주도록 했다. 세종실록 26년
- 조혁연 (2013.12.05 16:19:13)
- 0
- 4
-

조선시대 영남·충청·호남 인구는
조선시대 인구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문헌으로 '호구총수'(戶口總數)가 있다. 편찬 시기는 다소 불명확하나 대체로 1789년(정조 13) 규장각에서 한성부의 기록을 기초로 9책 분량으로 간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 1책은 1395년(태조 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와 1789년 한성부의 인구 상황을 기록했다. 그리고 제2∼9책은 1789년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도·원춘도(原春道)·충청도·황해도·전라도·평안도·경상도·함경도 순으로 기재했다. 충청도의 인구 변화에 대한 흐름은 제 4책에서 만날 수 있다. '호구총수'를 보면 1789년 충청도의 인구수는 86만8천2백19명으로 전국 11.7%를 차지했다. 반면 전라도는 122만2천8백4명으로 전국 16.5%의 인구 분포도를 보였다. 이밖에 경상도는 159만9백73명으로 21.5%의 분포도를 보였다. 하삼도의 이같은 인구 추이는 얼마전까지 계속 됐다. 그러다가 세종특별시의 도시 기능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충청권이 호남권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을 근소하나마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금년 5월쯤이었고,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이지고 있다. 안행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 조혁연 (2013.12.03 17:17:55)
- 0
- 4
-

최현배, 초정=한글 성지로 인식하다
우리 눈이 가로로 넓듯이, 읽는 것 역시 가로 문장이 편한 구조로 돼 있다. 한글은 초·중·종성이 한데 모아져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로로 써야 훨씬 능률적이다. 한글의 이런 특장은 IT와 최고의 궁합으로 결합하고 있다. 한글이 갖는 무궁무진한 자모음의 조합성과 인체 구성에 맞는 가로쓰기는 한글을 IT시대의 최강 문자, 그리고 한국을 IT 최강국으로 만들고 있다. 근현대 한글의 역사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주시경과 최현배(崔鉉培·1894~1970) 선생이다. 주시경이 한글문법의 뼈대를 세웠다면, 최현배는 한글전용과 가로쓰기 이론을 완성하고 실천했다. 국내 유력 일간지들은 90년대 중반까지도 세로쓰기를 고수했다. 그러나 최현배 선생은 그보다 50여년 앞선 지난 1946년 '한글가로글씨연구회'를 만들었고, 70년대는 '한글전용'을 주장했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 8월 최현배 선생이 청원의 궁벽한 마을인 초정약수를 이례적으로 찾았다. 그는 당시 동아일보 청주지국장인 김동환의 초청으로 '청남학교'에서 한글강습회를 가진 후 초정약수를 찾았다. 그가 이날 쉽지 않은 발길을 한 것은 '초정약수=한글의 성지'라는 의식을 굳건히 갖고 있었기 때문
- 조혁연 (2013.11.28 17:04:41)
- 0
- 4
-

'욕객'이 전국에서 몰려들다
초정약수는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전국적인 명소였다. 당시 오오꾸마쇼지(大熊春峰)라는 일본인이 '청주 연혁지'(1923년)를 저술했고, 이 책은 지금도 일제 강점기 기간의 청주지역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초정약수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매년 여름철에는 이 영천을 개방하는 관습으로 가까운 고을이나 가까운 곳에서 찾아 들렸으며 50리, 1백리, 멀리는 수 백리를 가리지 않고 이 지역으로 모여들어 몇 만명이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처럼 수만명의 인파가 일시에 초정약수로 몰려들 수 있었던 것은 충북선이 개통된 직후였기에 가능했고, 그 관문 역할을 한 공간은 내수역이었다. '淸州 椒井 露泉開湯' 제목의 동아일보 7월 29일자는 '기차삯 할인도 있다'고 밝혔다. '충북의 특산이고 전조선에서 유명한 청주 초정 물탕은 오는 8월 3일부터(20일간) 개방하게 되었다 하는데 음수객의 편의를 위하야 충북선 각역에서 내수역까지 기차 할인과 자동차 할인이 있다는데 위장병에 더욱 효과가 있다 한다.' 초정약수의 명성이 워낙 높다보니 일부 신문사는 '탐음단'을 모객하기도 했다. 중외일보 1927년 8월 7일자에는 '초정영천 탐음단…
- 조혁연 (2013.11.26 13:41:09)
- 0
- 4
-
세종대왕 길,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다
- 조혁연 (2014.02.25 15:30:25)
- 0
- 4
-
67차 클린마운틴, 대청호둘레길 1구간
- 임영훈 (2014.02.23 17:49:32)
- 0
- 11
-
충청감사 윤현, "조선 제1의 호조판서"
- 조혁연 (2014.02.20 14:37:20)
- 0
- 4
-
'제증청주인'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
- 조혁연 (2014.02.18 19:07:41)
- 0
- 4
-
강원도, 옥봉詩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다
- 조혁연 (2014.02.13 17:22:03)
- 0
- 4
-
한시 잘 짓는 솜씨, 중국까지 알려지다
- 조혁연 (2014.02.11 17:05:50)
- 0
- 4
-
한시 '괴산군수가 되신 운강공께'를 짓다
- 조혁연 (2014.02.06 15:54:38)
- 0
- 4
-
글 잘짓는 남자의 첩이 되길 원하다
- 조혁연 (2014.02.04 13:26:18)
- 0
- 7
-
'옥천의 여자 정지용'으로 불러도 될 듯
- 조혁연 (2014.01.28 17:39:38)
- 0
- 4
-
남겨진 가족들,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다
- 조혁연 (2014.01.23 16:25:37)
- 0
- 7
-
김옥균 시신, 옥천 청산에 매장됐었을까
- 조혁연 (2014.01.21 15:27:10)
- 0
- 7
-
사지의 하나, 충주에서도 효시되다
- 조혁연 (2014.01.16 16:27:58)
- 1
- 13
-
죽어서야 남편 곁으로 다가가다
- 조혁연 (2014.01.14 14:41:36)
- 0
- 5
-
김옥균 부인과 딸은 왜 옥천으로 피신
- 조혁연 (2014.01.09 14:58:20)
- 0
- 4
-
옥천 출신설, 왜 자꾸 거론될까
- 조혁연 (2014.01.07 15:48:46)
- 0
- 4
-
청주 이승우씨, 김옥균 바둑판을 발견하다
- 조혁연 (2014.01.02 15:24:15)
- 0
- 4
-
세종이 하사한 책, 청주목 학문발달 기여
- 조혁연 (2013.12.26 16:09:19)
- 0
- 4
-
세종, 신간을 청주향교에 하사하다
- 조혁연 (2013.12.19 16:15:06)
- 0
- 4
-
청원 송천서원과 여말선초의 최유경
- 조혁연 (2013.12.17 16:17:14)
- 0
- 4
-
충북출신 포로들, 귀국길에 오르다
- 조혁연 (2013.12.12 15:55:51)
- 0
- 4
-
자유한인보 포로명단, 3호 것이 아니다
- 조혁연 (2013.12.10 17:35:57)
- 0
- 4
-
조선시대 충주와 회인의 인구 차이
- 조혁연 (2013.12.05 16:19:13)
- 0
- 4
-
조선시대 영남·충청·호남 인구는
- 조혁연 (2013.12.03 17:17:55)
- 0
- 4
-
최현배, 초정=한글 성지로 인식하다
- 조혁연 (2013.11.28 17:04:41)
- 0
- 4
-
'욕객'이 전국에서 몰려들다
- 조혁연 (2013.11.26 13:41:09)
- 0
- 4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오는 30일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 개최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예술 거점 공간' 충북아트센터 건립 시동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실시간 댓글
- 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 세계종교가, 한나라때 동아시아에 보급된것입니다.@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
- 보다 야외에서 행해져 온 전통이 강합니다. 조상숭배는 실내의 廟와, 실외의 墓에서 복합적으로 거행해옴. 공자님제사는 성균관과 향교의 실내 사당에서 거행.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유교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해,달,별 숭배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발명한 황하문명 은나라때, 하늘로 승천하여 계절을 다스리시는 上帝숭배가 있었고, 주나라때, 天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은나라왕족의 후손이신 공자님께서 하느님(天)숭배와, 조상신이 되신 五帝숭배, 하위의 神明숭배 전통을 계승하시고, 인간의 도리를 설파하셔서, 유교라고 부르는 세
- 한나라이후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로 수천년.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유교는 하느님(天)과 日月星晨의 하위神, 山川의 神을 숭배하는 명절들이, 실내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마지막 근무일 퇴근 ‘10분’ 전 ‘해고’ 통지 ㅜㅜ; 행정 조폭(충북교육청) 조직적 근로자 사냥 ;; ■ 급여 착취, 갑질...후, 해고;;;! 한 ~ 충북 교육청 ! ... ..... .....
- 의사분들 좀 자성하길! 의료진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껏 의사들 집단행동했던걸 기억하건데 자신들 밥그릇 챙기느라 행동했던거 아닌가?
- 사람이 두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신변비관? 참 간단하게 말씀하시네요 경찰분들 그분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 안 하시고... 돌아 가신분들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 삼천만원도 안되는데 아파트라 정말 좋은조건으로 들어간다고 기뻐했을겁니다 법을 몰라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용한 사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요
- 누가 뭐라든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매거진 in 충북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경쟁력 개발"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