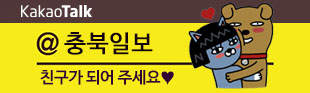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옥천 죽향초등학교
1930년대 단층짜리 목조교사 건축… 목조가구형식 보존
교사 내부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책걸상·문구류 전시
2015.06.18 15:45:35

[충북일보] 일제시대의 학교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옥천 죽향초(교장 변상수).
죽향초의 학교부지는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과거 옥천지역의 중심지였던 학교인근은 옥천향교와,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등이 있다.
대한민국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죽향초의 옛 건물은 정면이 운동장을 마주하고 있고 배면은 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옛 교사인 이곳은 정문에서 이어져 있는 화단에는 육영수 여사의 휘호가 적힌 기념비와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놓여있다.
죽향초의 역사

1909년 3월 9일 개교한 죽향초는 그해 10월 창명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4학년제를 운영했다. 1911년 회 졸업식을 갖고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에 삼양초를 분리해 줬다. 1947년에 교가를 제정했고, 1950년 6.25때 교실 12칸이 불에타 없어지고 교실 1칸과 강당이 파괴되기도 했다.
현재 본관건물 자리에는 6.25때 소실되었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교사 건물은 교실 3칸과 복도, 진입로로 구성돼 있다. 복도 양 끝에 출입구가 있고 복도는 천장 마감이 없어 가구재가 그대로 노출돼 지붕의 경사면이 드러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의 죽향초 건물

목조교사는 갑오경장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보통학교 교사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벽돌조나 철근콘크리트조로 개축되기 전까지는 1930, 1940년대 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공립보통학교는 각 부나 군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나 구조, 의장은 차이를 나타낸다. 1902년대에 들어서면서 목조외에 목골철망콘크리트조,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이 사용됐다.
1930년대 건축된 것으로 알려진 죽향초의 옛건물은 경성부의 인현, 재동, 정동, 교동 등에서 나타나는 2층의 일본식 목조 교사와는 달리 단층으로 건축됐다.
죽향초의 목조건물은 지방 소도시의 목가구조 형식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당시의 학교 목조건물은 내부바닥은 육송판재로 돼 있고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의 구운기와나 시멘트기와 또는 함석을 이었다.
내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외벽체는 목조는 판재로, 조적조는 회반죽 바르기를 주로 했다.
죽향초의 옛 교사건물도 외관은 목재비늘판벽(영국식 비늘파벽) 가로마감의 편복도형의 단층목조건물로 1930년대 근대 보통학교 건축물의 기본형태를 따르고 있다.
죽향초 옛 교사의 구조와 재료
죽향초의 옛 교사는 1930년대 당시 일반적인 학교 건물과 같이 목조가구식 구조에 박공지붕 형태로 규모가 작은 단층건물이다.
기단위에 놓여진 형태는 확인이 불가하나 외부에 노출된 부분으로 볼 때 주초위에 나무기둥을 올려놓고 벼겣와 지붕에서 이음처리를 했다.
지붕은 목조기둥 상부에 깔도리를 두고 직각방향으로 평보를 보낸후 'ㅅ'자보와 처마도리를 결구시켰다. 상부에 왕대공 형태의 목조트러스를 두었고 접합부위는 목재쐬기를 이용한 고정철물 접합으로 돼 있다.
죽향초의 옛 교사는 목조나 조적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바닥은 육송판재, 지붕은 박공지붕 형태다.

지붕은 목조특위에 함석골판으로 마감했고 외벽과 교실 내부 바닥은 목재 널판, 외벽은 적갈색페인트로 도색했고 저층부는 시멘트 몰타르를 이용해 상층부의 비늘판벽과 같은 형태의 마감을 했다.
창호와 문틀은 목대틀로 만들었고 파란색 페인트로 도색했다. 교실내부 천정은 격자모양의 목재틀과 목재널판으로 마감하고 연노란색의 페인트로 도색했고 내벽은 회반죽으로 마감했다.
현재 죽향초 옛 교사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책걸상, 집기류, 문구류, 교과서, 상장, 앨범 등 다양한 물건을 전시하고 있어서 옥천지역의 학교 사료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손근방.김병학기자
<인터뷰>유봉렬 죽향초 총동문회장

"죽향초는 옥천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명문학교다. 인재배출과 함께 역사의 산 증인으로 성장 발전해왔다"
유봉렬 동문회장은 "해방후 학교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겨울에 학교갈때에는 장작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다"라며 "당시에는 옛날 교사에서 공부를 할 때 교실밑에 굴을 파서 다른 반 학생들에 가져온 장작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후 발각이 돼 학생들끼리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6.25가 발발후 미군들이 추워 마루바닥을 뜯어내 연료로 쓰기도 해 맨바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를 했다. 공부하는 환경은 일제시대보다 못했다"고 회고하며 "국군과 인민군(북한군)간 총격전이 벌어지는 것을 가끔 보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일제시대 교육에 대해 "일본인들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들었다"라며 "책상은 송판같은 것을 이용해 양쪽에 구멍을 뚫어 목에다 걸고 공부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생활상은 비참했다. 일본인들이 쌀을 모두 가져가고 콩깨묵을 먹고 살았다. 콩깨묵이 썩은 것을 먹기도 했다. 당시는 썩은 콩깨묵도 부족한 시절이었다. 도토리를 가루로 내 먹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침에 등교하면 공하나로 전교생이 운동을 하기도 했다. 운동장에 선(금)을 그어놓고 놀이를 즐기기도 했고 비석치기, 구슬치기 등의 놀이도 즐겼다"며 "죽향초 동문들은 죽향초를 졸업했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청주 문의초등학교 2015-10-29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보은 회인초등학교 2015-10-22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단양 단양초등학교 2015-10-01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청주 청남초등학교 2015-09-17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제천 청풍초등학교 2015-09-10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충주 엄정초등학교 2015-08-27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옥천 청산초등학교 2015-08-20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제천 동명초등학교 2015-08-12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음성 수봉초등학교 2015-08-06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영동 영동초등학교 2015-07-24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단양 영춘초등학교 2015-07-16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진천 상산초등학교 2015-07-09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괴산 명덕초등학교 2015-07-02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보은 삼산초등학교 2015-06-11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충주 교현초등학교 2015-05-21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제천 백운초등학교 2015-05-14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청주 주성초등학교 2015-04-30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괴산 청안초등학교 2015-04-16
- 100년의 학교역사가 말한다 - 괴산 연풍초등학교 2015-04-09